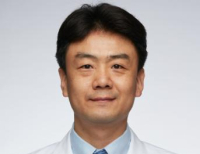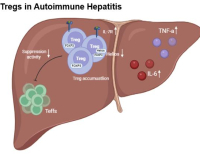요즘처럼 더운 여름 ‘졸졸’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 대부분 시원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참을 수 없는 배뇨감을 느낀다. 하루 평균 10번 이상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과민성방광 환자는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이 달갑지 않다. 장시간 차를 타고 이동하는 여행은 화장실 걱정 탓에 부담스럽기만 하다.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곤란했다면 과민성방광 환자의 삶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이 질환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방광이 예민해지는 것으로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참을 수 없는 배뇨감이 나타나는 요절박,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야간뇨, 화장실에 가다 소변이 새는 절박성요실금 등이 동반된다.
과민성방광 환자는 매일 밤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탓에 피로가 누적되고, 수시로 찾아오는 배뇨감과 언제 샐지 모르는 소변에 대한 걱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배뇨감으로 화장실로 뛰어가다 낙상사고를 당할 위험도 높다.
방광염과 증상이 비슷한데 방광염은 소변을 볼 때 요도가 찌릿하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동반된다. 즉 통증 없이 소변만 자주 마렵거나, 잔뇨감이 수 주 이상 지속될 땐 과민성방광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조사결과 국내 성인의 과민성방광 유병률은 12.2%로 국내 성인 10명 중 1명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유병률은 여성이 14.3%로 남성(10.0%)보다 높았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는 노화로 방광이 약해져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치부하거나, 비뇨기질환을 앓고 있다는 수치감에 병원 방문을 주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윤하나 이대목동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과민성방광은 방치하면 경제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수면부족으로 인한 체력저하, 심리적 불안감에 의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는 먼저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를 실시한 뒤 부작용이 있거나 치료 효과가 미진하면 2차로 수술과 주사치료에 들어간다. 단 평소 배뇨 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료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으므로 행동치료를 적극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윤하나 교수는 “과민성방광 환자는 방광을 자극하거나 이뇨작용을 하는 식품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며 “방광근육을 늘려주는 케겔운동, 정해진 시간에 배뇨하는 시간제배뇨법 등 행동치료법으로 정상적인 배뇨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과민성방광은 장기적으로 치료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치료효과가 나타났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