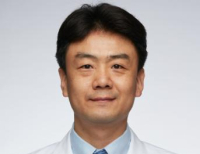공황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한해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 환자는 5년간 2배로 늘었고, 30∼50대가 70%가량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공황장애를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5만1000명에서 2015년 10만6000명으로 연평균 15.8% 증가했다. 연령대별 환자 수와 비중은 40대 2만7326명(25.7%), 50대 2만3954명(22.6%), 30대 1만8664명(17.6%) 순으로 조사됐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려 죽을 것 같은 공포 증상을 나타낸다.
여성 환자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남성 환자는 2010년 2만6198명에서 2015년 4만9669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6%, 여성은 2010년 2만4747명에서 2015년 5만6471명으로 연평균 17.9% 증가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공황장애 환자가 늘어난 것은 매스컴을 통해 공황장애에 관한 정보가 알려진 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5년 인구 10만명 당 인령대별 진료인원은 남성의 경우 40대가 3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275명, 70대 이상 269명 순이었다. 여성은 40대와 60대가 각 316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3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기존 문헌에 따르면 공황장애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연령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40대가 직장생활에서 권위적 윗세대와 자율적 아래 세대 사이에서 직무 부담이 가장 큰 탓에 공황장애가 빈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40대부터는 신체 건강이 서서히 쇠퇴하고 아저씨, 아줌마라는 호칭과 함께 더 이상 젊은이로 불릴 수 없게 된다”며 “기혼자는 신혼 초의 열정이 식고 권태기가 시작되며, 자녀의 학업 뒷바라지 등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진단했다.
70대 이상 노인 중 공황장애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010년 82명에서 2015년 276명으로 3.4배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 교수는 “많은 노인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나 되는 국내 노인의 자살률과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공황장애 초기에는 가끔 공황발작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면 환자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우울증을 겪거나 술에 의존하게 된다. 심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
공황장애의 공황발작은 갑자기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숨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10분 안에 증상이 최고조에 달한다. 발작은 20~30분 계속되고 1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된 치료법으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있다. 약물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항우울제의 한 종류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가 우선적으로 권장된다.
이 교수는 “약물치료 후 증상이 가라앉으면 재발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약물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며 “약물치료를 유지하다가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치료를 중단한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