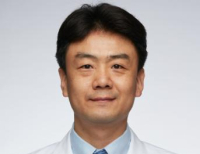2014년 이헌정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젊은 성인 남성 23명을 대상으로 빛이 전혀 없는 방과 5·10lux의 빛공해가 있는 방에서 잘 때 수면의 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밝은 세기가 강한 방에서 잘수록 총 수면시간(Total sleep time)은 감소한 반면 잠든 후 깸(Wake after sleep onset)은 유의하게 증가했다. 또 상대적으로 얕은 수면인 N1단계가 증가하는 대신 깊은 수면을 의미하는 N2단계는 감소했다. 특히 10lux 방에서 잠을 청한 사람은 수면 후 좌뇌·우뇌·전두엽 등의 활성도가 뚜렷하게 저하됐다.
과도한 빛은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빛공해에 노출되면 결막충혈, 안구 건조, 눈 피로감, 눈 통증 등이 나타난다. 밤새 불을 켜둔 방에서 자는 아이의 절반 이상이 16세 이전에 근시가 된다는 연구도 있다. 장기적으로 노출 시 황반변성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과거 노인성질환이던 황반변성이 중장년층에서도 자주 발병하는 이유 중 하나로 빛공해가 꼽히고 있다.
빛공해와 유방암 사이의 연관성도 밝혀졌다. 2014년 이스라엘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빛공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여성은 유방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7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한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과도한 빛이 몸속 호르몬 중 암 발생을 막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막아 유방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빛공해는 맥박과 혈압을 높이고 생체리듬을 교란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문명의 이기는 잠자리 이불 속까지 빛을 침투시켰다. 스마트폰은 사용빈도가 잦고 눈과 거리가 가까운 데다 TV나 컴퓨터와 달리 잠들기 직전까지 빛공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하다. 스마트폰 화면은 가장 어둡게 조정해도 80칸델라 수준이며 최대 밝기에선 500칸델라를 훌쩍 넘는다. 이향운 이대목동병원 수면센터 신경과 교수는 “스마트폰은 손바닥만한 화면에서 컴퓨터 모니터보다 밝은 빛이 나오는 만큼 부작용도 강력하다”며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 아이는 수면장애와 학습부진에 시달리기 쉽고 성인도 빛공해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자리에 든 이후 아주 잠깐 스마트폰의 빛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숙면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이헌정 교수는 “특히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색 계열 빛인 블루라이트(청색광)는 안구내 활성산소를 급증시켜 시각세포를 최대 80% 파괴하고 안구건조증과 망막 및 수정체 손상를 유발할 수 있다”며 “눈 건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수면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가급적 빨리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빛공해 관리 기준은 느슨한 편이다. 2013년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주택가 창문 연직면에 비춰지는 빛이 10lux를 초과하면 빛공해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주거지역에 한해 3lux, 독일은 1lux 이하로 인공조명 밝기를 제한하고 있다.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생활습관부터 바꾸는 게 좋다. 이향운 교수는 “잠들기 한 시간 전, 밤 10~11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등 인공조명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백색 계열의 주광색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푸른색 파장이 많이 나와 침실 조명은 더 노란색을 띠는 전구색 계열 조명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잘 땐 약간의 불빛도 없이 실내를 무조건 어둡게 해야 한다. 눈을 감더라도 시신경이 미세한 빛을 감지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 살고 있는 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불빛이 침실로 새 들어온다면 관할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