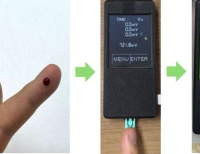치료 후 삶의 질이 떨어진 폐암 환자는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이종목·김문수 국립암센터 흉부외과 교수, 심영목·조재일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팀과 함께 2001~2006년 국립암센터 및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후 완치를 판정받은 폐암 환자 809명의 5년간 추적관찰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 전체 환자의 11.9%(96명)가 연구 기간에 사망했다. 신체기능이 떨어진 환자는 사망 위험이 2.4배 높았으며, 호흡곤란(1.6배), 불안(2.1배), 질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이겨내는 내적역량 저하(2.4배) 등도 각각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저체중(1.7배)과 수술 후 운동 부족(1.5배)도 사망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졌던 폐암 예후인자인 연령, 성별, 종양 특성 외 삶의 질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사망 위험 간 상관성을 장기간에 걸쳐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윤 교수는 “최근 연구된 자궁경부암에 이어 폐암도 삶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며 “삶의 질 요인은 향후 유전자 분석에 기반한 정밀의학에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30만명 이상의 국내 암경험자 중 대다수가 치료 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재발이나 사망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갖고 있다”며 “암 치료 후 재발 위험은 물론 운동 및 식이 등 삶의 질을 평가 및 관리하는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보험수가 인정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종양학 분야 권위 학술지인 ‘바이오메드센트럴 암(BMC Cancer)’ 7월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