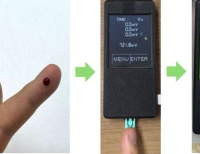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가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뇌전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해자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가 먼저 뺑소니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지만 운전자의 뇌전증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뇌전증은 뇌의 비정상적인 과흥분이나 과동기화로 발작이 반복해 나타나는 만성 신경질환으로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전세계 약 6500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뇌전증학회 조사결과 국내 환자는 2012년 기준 19만 2254명으로 인구 1000명당 4명의 유병률을 기록 중이다.
유병률은 실제 환자 수보다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가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사회 인식 또는 차별 탓에 질병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은 대부분 증상 조절이 가능하고 일부에서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그동안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선입견 탓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했는데 이번 해운대 사건을 계기로 다시 좋지 않은 시선이 확대되진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결과 2014년 뇌전증 환자 수는 총 13만8277명으로 소아 및 청소년기 환자가 전체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보통 발병 연령대에 따라 원인이 다르다. 소아 및 청소년기엔 분만손상, 중추신경계 발달장애, 유전성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꼽힌다. 중년 이후에는 뇌졸중, 고령에서는 퇴행성 신경질환이 뇌전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밖에 전 연령대에서 뇌 외상, 중추신경계 감염, 종양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신 교수는 “뇌전증 진단의 첫 번째 키포인트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자세한 대화를 통한 문진”이라며 “이 과정에서 뇌전증 발작이 맞는지 여부와 발작 형태를 구별하고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 스스로 발작을 느낄 수 있지만 복합부분발작 등은 환자가 발작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문진 과정에서 보호자의 설명이 중요하다.
뇌파검사와 뇌영상검사는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된다. 하지만 이런 검사로도 진단이 불가능한 특발성 뇌전증의 비율이 20~30%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치료법으로 쓰이는 항경련제는 신경세포의 흥분 및 발작을 억제한다.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약물치료만으로 완치 가능하지만 나머지 30%는 약제불응성 난치성에 해당돼 수술치료, 미주신경자극술, 케톤식이요법 등이 필요하다.
신 교수는 “사회적인 이슈 탓에 제도와 법이 한순간에 바뀔 경우 사회적 편견을 의식해 치료받지 않는 환자가 늘게 되고, 이는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제로 해운대 사고 이후 발작이 잘 조절되는데도 운전면허가 제한되거나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이 잘 조절되는 뇌전증 환자의 교통사고율은 일반인과 거의 비슷하다”며 “지나친 우려로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