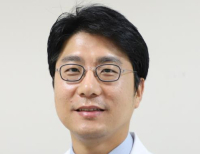직장인 양모 씨(28)는 최근 질 주변이 가렵고 분비물에 피가 섞여 나와 큰맘 먹고 산부인과를 찾았다. 예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엔 예전보다 정도가 심한 것 같아서 미룰 수 없었다. ‘질염이겠거니’하고 가볍게 여겼지만 검사 결과 ‘자궁경부염’으로 진단받았다.
성관계를 갖는 중 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평소 질 주변이 간지럽고, 질분비물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자궁경부염일 가능성이 높다. 주로 임균(Neisseria gonorrhoeae)이나 클라미디아균(Chlamydia trachomatis)에 감염돼 자궁내경관에 염증이 생겨 뮤코퍼스(mucopus)로 불리는 노란색이나 연두색을 띠는 점액화농성 분비물이 나온다. 하지만 대개는 증상이 없어 나팔관, 난소, 복막 등으로 염증이 번져 골반염으로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궁경부는 질의 맨 윗부분으로 자궁이 질 상부로 돌출된 입구다. 이는 피부처럼 매끄럽고 분홍빛을 띠는 ‘편평상피세포’와 자궁내경관에서 유래해 오돌토돌하고 붉은빛을 띠며, 분비물을 생성하는 ‘원주상피세포’가 감싸고 있다.
자궁경부염은 상피세포의 종류에 따라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이 달라진다. 편평상피세포로 이뤄진 자궁외경관(ectocervix)은 질에 염증을 일으키는 트리코모나스원충(trichomonas), 칸디다균(candida), 헤르페스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 HSV) 등에 의해 염증이 나타나기 쉽다. 반면 임균이나 클라미디아균은 분비기능이 활발한 원주상피세포로 이뤄진 자궁내경관에만 감염을 일으킨다.
김태준 호산여성병원 산부인과 원장은 “편평상피에 유발된 질염이 오래 방치됐거나, 성관계를 가질 때마다 불편하면 자궁경부에 염증이 생기며 표면이 울퉁불퉁 빨갛게 헐며 변화가 일어난다”며 “간혹 선천적으로 헐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성관계 시 작은 자극에도 자궁경부염이 쉽게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생활습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자에 장시간 앉아 일하거나, 스키니진·레깅스 등 통풍이 제대로 안되는 옷을 매일 입거나, 질을 너무 자주 세척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도 유발될 우려가 있다.
자궁경부염 검사는 면봉으로 자궁내경관 분비물을 채취한 뒤 점액화농성 분비물이 노란색이나 연두색을 띠는지 확인한다. 채취한 질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염증을 일으킨 세균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채취한 질분비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염증세포(백혈구)가 다수 포함돼 있고, 염색 후 그람음성쌍구균(gram-negative diplococci)이 보이면 임균 감염에 의한 자궁경부염으로 진단한다. 쌍구균이 관찰되지 않으면 클라미디아균에 의한 자궁경부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50%에서는 임균이나 클라미디아균이 아닌 다른 알 수 없는 세균에 의해 증상이 발생한다. PCR(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면 쉽게 원인균을 찾을 수 있다.
자궁경부염을 치료하는 데에는 크게 염증에 대한 ‘항생제치료’와 헐은 부위를 파괴시켜 새살이 돋게 하는 ‘파괴치료’로 나눌 수 있다.
임질이나 클라미디아균에는 주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한다. 항생제치료는 급성 자궁경부염에서 필수적인데 세균배양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한다. 그러나 만성 염증에서는 배양검사에서 원인균이 잘 검출되지 않으므로 증상이나 진찰상 염증 소견이 있으면 경험이나 이론에 바탕해 적당한 항생제나 소염제를 써서 증상을 경감시켜준다.
김태준 원장은 “자궁경부염은 흔히 세균성 질염과 동반되므로 세균성 질염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배우자와 함께 항생제로 치료하고, 문제가 없다면 1주일 정도 약물치료를 시행하며 경과를 지켜본다”고 말했다.
정도가 심한 사람은 파괴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이는 급성 염증이 없을 때 택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헐어 있는 자궁경부조직을 파괴한다. 크게 △열치료 △냉동치료 △전기치료 △레이저치료 등이 있다.
열치료는 조직이 응고되도록 100도가 조금 넘는 온도의 기구를 활용하며, 냉동치료는 냉동가스로 기구에 닿는 부분과 그 주변조직을 얼려 제거한다. 전기로 높은 온도를 내는 기구로 병변을 소작하는 전기치료와 레이저로 조직을 증발시키는 레이저치료도 흔히 쓰인다.
각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나 자궁경부염 치료에는 별 차이가 없어 의사의 선호도에 맞는 치료법이 쓰인다. 마취나 입원 없이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파괴치료를 받으면 상처가 아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김 원장은 “시술 후 처음엔 피섞인 분비물이 나오다가 2~3주 정도 맑은 냉이 흐르기도 한다”며 “이는 파괴된 자궁입구 조직에서 나오는 진물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괴력이 강한 전기치료·레이저치료 후에는 간혹 상처가 아물면 혈관이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료 과정시 세균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약이나 주사 등 다른 치료를 계속할 필요는 없다. 제대로 치유되는지 경과를 관찰하면 된다.
김태준 원장은 “자궁경부염 예방의 시작은 ‘질염 예방’”이라며 “감기를 예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양밸런스를 맞추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등 면역력이 좋은 상태로 유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