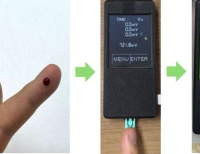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병가라도 쓰고 쉬고 싶지만 보수적인 조직 분위기 탓에 우울증이란 단어조차 입 밖에 꺼내기 어려웠다. 갈수록 업무 성과가 떨어지자 질책과 자책에 사로잡혀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됐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마음의 상처를 가다듬을 휴식기 없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병가를 내더라도 평균 10일 정도 짧게 쉬었다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직장내 편견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진표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김영훈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2일 공개했다. 연구팀이 현재 또는 최근 1년 사이 직장에 다닌 18~64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4명(7.4%)이 우울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우울증 평생유병률과 같은 수치다.
우울증 진단 후 병가를 신청한 직장인은 31%(23명)에 불과했으며 병가 기간은 9.8일에 그쳤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7개국의 경우 우울증 진단 환자의 51%가 병가를 신청했고 병가일수도 35.9일에 달해 한국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 국내 직장인들은 병가를 낼 때도 다른 이유를 대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34%(23명 8명)만 휴가신청 사유에 우울증이라고 적었다. 사유에 우울증을 적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75%가 ‘우울증인 것을 알면 직장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63%는 ‘말을 하더라도 나를 이해해줄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변했다.
직장동료가 우울증이 있다고 인지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212명 중 가장 많은 65명(30.2%)이 ‘우울증 관련 대화를 회피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움을 제안하겠다’는 답변은 28.8%,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28.8%로 조사됐다.
김영훈 교수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직장인은 의욕 및 집중력 저하, 피로감 등으로 단순한 업무 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직장 내 분위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머뭇거리거나 실수할 가능성도 커 회사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 우울증을 진단받고 계속 일을 하는 직장인 중 상당수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인지기능장애를 보였다. 우울증 진단 직장인의 57.4%가 집중력 저하를 보였고, 27.8%는 계획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 25.9%는 의사결정능력장애, 13%는 건망증 증상을 나타냈다.
홍진표 교수는 “우울증을 진단받아 직무수행이 힘들 땐 눈치 보지 않고 병가를 내거나 결근할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회사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치료 및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신경정신의학’ 최근호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