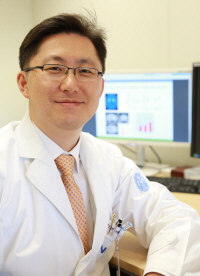 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의태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 탓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흔히 ‘노이로제’로 불리는 ‘강박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예컨대 손을 씻었는데 금방 더러워진 것 같아 진물이 날 정도로 몇 번씩 손을 다시 씻는 행위가 강박증에 해당된다. 이런 증상은 한국인 100명 중 3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
과거에는 심리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됐지만 최근 분자영상학의 발달로 뇌의 신경학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뇌의 기능적 이상, 특히 신경 계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시스템 고장이 주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세로토닌은 뇌 속에서 수용체와 결합해 불안감을 조절하는 신경호르몬 중 하나다. 분비량이 적거나, 붙어 있어야 하는 수용체에서 빨리 소실될 경우 세로토닌 수용체 밀도가 낮아져 강박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강박증은 이를 교정하는 약물치료가 핵심이다. 진단과 치료경과를 알아보는 기존 뇌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세로토닌과 약물을 구분하기 어려워 세로토닌 수용체 밀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언제까지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하는지, 언제 완치 판정을 내려야 하는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이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의태 교수팀은 건강한 일반인 12명과 약물치료 중인 강박증 환자 12명의 뇌 PET 영상을 시간 경과에 따라 20~30회 촬영 후 비교하는 동시에 투여한 약물의 농도 변화를 체크했다. 영상 비교와 혈중 약물농도 변화 체크를 동시에 실시하는 새 방식을 통해 PET 영상에서 세로토닌 수용체만의 밀도를 계산해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새 방식을 통해 약물치료 중인 강박증 환자 12명의 세로토닌 수용체 밀도를 측정한 결과 증상이 호전됐더라도 여전히 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물치료로 증상은 개선됐지만 실제 강박증 원인인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은 교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즉 이번 연구로 치료 후 강박증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세로토닌 시스템 이상이 정상화될 때까지 일정 기간 약물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뇌의학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의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강박증 약물치료의 한계점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며 “강박증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건강학적 질환에서도 심도 있는 뇌연구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김 교수팀의 주도로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정신건강연구소의 올리워 호웨스(Dr. Oliver Howes) 교수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연구결과는 정신의학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정신의학저널(Psychological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