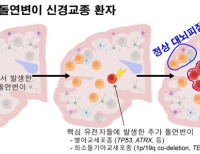국내 급여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다중 적응증을 가진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급여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다중 적응증을 가진 혁신 신약의 접근성이 낮은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소병훈·김윤·장종태 의원과 함께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다중 적응증 약제의 급여 지연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았다.
서미화 의원은 개회사에서 “급여등재 절차의 복잡성과 단일 약가 구조 등으로 환자의 치료 기회가 제한받고 있다”며 “국가는 환자 삶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RPIA 배경은 회장은 “동일한 약제라도 적응증에 따라 치료 효과나 환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약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종양내과 홍정용 교수는 “임상적 가치가 입증된 혁신 신약들이 국내에서는 급여 지연으로 치료 기회를 잃는 상황”이라며, “여러 적응증에서 효과가 있는 신약의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는 ‘적응증 가중평균가(Blended Pricing)’ 제도를 소개하며 “같은 약제라도 환자 수, 비용효과성, 대체치료 유무 등을 고려해 적응증별 약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과 환자 접근성 개선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환자단체,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 제도의 한계를 짚고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다중 적응증 신약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약가 결정체계를 되돌아볼 시점”이라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보건당국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김형민 부장은 “재정과 접근성 간 균형뿐 아니라 타 제도와의 연계도 고려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