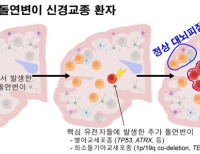김호진 국립암센터 박사, 프란시스코 퀸타나 하버드대 브리검여성병원 교수, 마이클 레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국립암센터는 신경과와 희귀난치암연구과의 김호진 박사 연구팀이 ‘2025년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신규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경쟁률은 19.6대 1로, 전년도(11.8대 1)보다 크게 상승할 만큼 한·미 연구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호진 국립암센터 박사, 프란시스코 퀸타나 하버드대 브리검여성병원 교수, 마이클 레비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국립암센터는 신경과와 희귀난치암연구과의 김호진 박사 연구팀이 ‘2025년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신규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경쟁률은 19.6대 1로, 전년도(11.8대 1)보다 크게 상승할 만큼 한·미 연구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선정된 연구과제 주제는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에서 신경교세포-면역세포 상호작용 규명 및 치료 표적 연구’다. 공동 연구는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과 브리검여성병원이 참여하며, 총 4년간 60억원 규모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이번 연구는 다발성경화증(MS),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NMOSD), MOG항체연관질환(MOGAD) 등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에서 별아교세포(astrocyte)를 중심으로 면역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정밀 분석하여, 염증 및 신경손상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림프구나 항체 등 면역반응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연구는 별아교세포의 면역조절 및 항원제시 기능에 주목해 질환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신경면역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김호진 박사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환자 코호트와 검체 자원을 기반으로, 프란시스코 퀸타나(Francisco J. Quintana) 미국 하버드대 브리검여성병원 교수 및 마이클 레비(Michael Levy)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교수팀과 협력한다.
공동연구에서는 단일세포 상호작용 분석기술(RABID-seq, SPEAC-seq)과 공간전사체 분석(spatial transcriptomics) 기술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세포 수준에서 질병 발생 과정을 규명하고, 치료 표적 검증까지 수행하는 통합연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호진 박사는 “별아교세포는 단순한 반응세포가 아니라 면역반응의 방향을 결정짓는 조절자임을 규명함으로써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중추신경계질환의 근본적인 이해와 차세대 치료전략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과제는 별아교세포 기반 병인 규명이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함과 동시에 질병 원인 기반 치료제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내 신경면역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발성경화증은 뇌와 척수에서 신경세포를 감싸는 수초에 염증이 생겨 다양한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은 시신경과 척수를 주로 침범하는 중추신경계 희귀 자가면역질환이다. MOG항체연관질환은 MOG 단백질에 대한 자가항체가 진단 표지자로 활용되는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군이다. 별아교세포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교세포의 일종으로, 면역반응 조절과 신경세포 보호 기능을 담당한다. 공간전사체 분석은 조직 내 세포 위치 정보를 보존한 채 어떤 세포가 어디에서 발현하는지 분석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다.
RABID-seq(Rabies Barcode Interaction Detection sequencing)은 세포 간 신호전달 및 상호작용을 단일세포 수준에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다. SPEAC-seq (Spatially Encoded Cellular Communication sequencing)은 조직 내 세포들이 실제 공간적 맥락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충재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국립암센터는 암진료향상연구과 이충재 박사후연구원이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TNBC)을 대상으로 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연구’를 발표해, 2025 일본암학회 연례학술대회(제84회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Cancer Association, JCA)에서 우수연구자상(Travel Grant Award)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충재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국립암센터는 암진료향상연구과 이충재 박사후연구원이 ‘삼중음성유방암(Triple negative breast cancer, TNBC)을 대상으로 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 평가 연구’를 발표해, 2025 일본암학회 연례학술대회(제84회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Cancer Association, JCA)에서 우수연구자상(Travel Grant Award)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암학회 연례학술대회(JCA)는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암 연구 학술대회로 올해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됐다. 2024년 한국유방암학회에서 발표한 ‘Breast Cancer Statistics in Korea’에 따르면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의 10~20%를 차지하며 가장 치료반응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특정 표적치료제가 없어 진단 후 5년 이내 사망률이 40%에 달하며, 다양한 항암제가 TNBC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치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신규 유도체 물질(ONG41008, ONG41003)의 항암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오스테오뉴로젠과 공동 수행했다. 두 후보물질은 기존 쑥 유래 천연물질인 유파틸린(Eupatilin)을 기반으로 설계된 합성 유도체로, 연구팀은 유방암 세포주를 활용한 체외(in vitro) 실험을 통해 두 물질의 암 억제 효능평가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두 물질(ONG41008과 ONG41003) 모두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사멸을 촉진시켰으며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퍼지거나 침투하는 것을 막는 전이 억제 효과를 보였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인 독소루비신(Doxorubicin) 및 파클리탁셀(Paclitaxel)과 병용투여 시 상승효과를 보였다. 현재 연구팀은 마우스 실험을 통해 이 두 후보물질의 생체 내 종양 억제 효과를 추가로 검증 중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공선영 교수는“이번 연구를 통해 삼중음성유방암 치료를 위한 신규 후보물질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향후 악성종양인 TNBC를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영윤‧박종웅‧홍석하‧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고영윤‧박종웅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팀이 지난 10월 16~18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제69회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전시 우수상’을, 홍석하‧한승범 교수팀이 ‘포스터 전시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고영윤‧박종웅‧홍석하‧한승범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고영윤‧박종웅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교수팀이 지난 10월 16~18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제69회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전시 우수상’을, 홍석하‧한승범 교수팀이 ‘포스터 전시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고영윤‧박종웅 교수팀은 ‘Effect of Decellularized Amniotic Membrane Hydrogels on Enhanced Wound Healing in a UVB-Induced Burn Model’ 이라는 포스터로 창상 치유 분야에서의 학문적 완성도와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차세대 재생의학적 치료소재 중 하나인 탈세포화된 양막을 이용해 제작한 생체 하이드로겔이 자외선(UVB)으로 유도된 화상 모델에서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팀은 초임계 이산화탄소(scCO₂) 기술을 적용해 양막의 세포 성분을 제거하면서도 콜라겐, 글리코사미노글리칸(GAG), 성장인자 등 주요 생리활성 물질을 보존한 고기능성 하이드로겔을 개발했다. 이후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항염증 효과와 혈관신생 촉진 효과를 확인, UVB로 인한 피부 손상 모델에서 탁월한 상처 회복 효과를 입증했다.
홍석하‧한승범 교수팀은 ‘Does Denosumab Offer the Same Protective Effect as Bisphosphonates After Total Hip Arthroplasty? A Nationwide Comparative Study’ 라는 포스터로,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골대사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규명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노수맙과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를 받은 인공고관절치환술 환자들을 비교 분석하여 수술 후 합병증 및 재치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전국 단위 연구다. 연구 결과, 두 약제 모두 재치환 예방 효과를 보였으나, 데노수맙은 비스포스포네이트 만큼의 주위골절 예방 효과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며, 특정 환자군에서는 오히려 골절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대규모 실제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골다공증 치료약제가 인공고관절 수술의 예후에 미치는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환자의 골대사 상태와 치료 약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수술 및 약물관리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