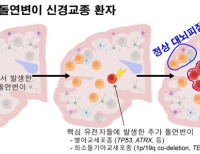중금속 중독(Heavy Metal Poisoning 또는 Toxicity)은 신체의 연조직에 독성 량의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이다. 연조직에 축적되면 웬만해선 쉽게 배출되지 않고, 중금속이 필수 미네랄과 경쟁하면서 신체기능을 저하 또는 마비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중금속 중 아연, 구리, 크롬, 철, 망간, 코발트 등은 매우 적은 양이지만 신체 기능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어떤 중금속이든 중독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농도로 체내에 축적되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중금속 중독은 산업 환경에서의 노출, 대기·토양·수질 오염, 식품 및 의약품을 통한 축적, 부적절하게 코팅된 식품용기, 페인트 등이 주된 섭취원이다.
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하고 위중한 유해 중금속은 납, 수은, 비소, 카드뮴이다. 알루미늄, 안티몬, 바륨, 비스무트, 구리, 금, 철, 리튬, 백금, 은, 주석, 아연 등은 상대적으로 덜 흔하고 경미하다. 그 중간쯤 되는 중금속은 크롬, 코발트, 망간, 니켈, 인, 셀레늄, 탈륨 등이다.
중금속 중독에 관한 역학조사는 의외로 적은 편이다. 직업적인 이유로 남성에게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영향이 포괄적으로 미치는 만큼 남녀가 대등소이할 것이라는 게 학계의 견해다.
다만 카드뮴은 여성에서, 납은 남성에서 더 많은 인원과 양이 농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뮴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내어 ‘이타이이타이병’의 경우 여성에서 주로 나타났고 여성 자손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남성은 혈중 납 농도가 여성보다 높고, 뼈에 더 잘 축적돼 뼈가 교체되는 시기가 연장됨으로써 골연화증 등에 더 취약하다.
납, 수은증기, 메틸수은 형태의 중금속은 임산부에서 태아로 쉽게 전달된다. 미국에서는 납중독이 1~3세의 영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 예컨대 과거에 코팅되지 않은 저가 수입산 프라이팬, 식기, 조리기구 등이 중금속 흡수의 주요 경로로 지목됐다. 약 20년간 이를 개선하려는 중금속 저감 노력이 이뤄진 덕분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혈중 납 농도를 지닌 어린이의 수가 85% 감소했다고 한다. 납 중독은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중금속 중독은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어 계속 신경써야 하는 이슈 중 하나다.
납중독(Lead Poisoning)
납 생산 작업자, 배터리 공장 작업자, 용접공, 납땜 작업자 등은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납에 과다노출될 수 있다. 납은 주로 뼈에 저장되지만 모든 장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납중독의 영향은 개인의 연령과 노출량에 따라 달라진다. 어린이의 경우 납 노출 정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하다. 일부는 눈에 띄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3~6주에 걸쳐 발생한다.
납 과다노출로 인해 소아는 덜 장난스럽고, 서툴고, 짜증나고, 무기력해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두통, 구토, 복통, 식욕부진, 변비, 불분명한 언어(구음장애), 신장기능 저하,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혈중 단백질(고단백혈증), 비정상적으로 창백한 피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안면창백은 적혈구의 낮은 철분 수치(빈혈)로 인해 발생한다.
납 과다노출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조정하는 능력 손상(운동실조), 뇌 손상(뇌병증), 발작, 경련, 시신경 부종(유두부종), 인지장애 등이 있다. 어린이라면 정신지체, 언어·인지·균형·품행·성적 등에서 결함과 문제행동을 겪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성인의 경우 납에 과다노출되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생식기관이 손상될 수 있다. 추가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피로, 무기력, 구토, 식욕부진, 복통, 변비, 관절통, 최근 습득한 기술 상실, 심신 부조화, 나른함, 수면장애(불면증), 과민성, 의식변화, 환각 그리고/또는 발작 등이다.
성인 일부에서는 빈혈, 말초신경병증, 뇌병증, 근력 및 지구력 감소, 적개심 등 행동변화, 우울증 그리고/또는 불안, 손목하수(手筋下垂, wrist drop, radial nerve palsy, 요골신경마비로 인해 손목의 신근이 마비돼 펼 수 없음) 등을 경험한다.
납은 소변과 대변으로 배설된다. 그러나 뼈가 아닌 머리카락, 손톱, 땀, 타액, 모유에도 나타날 수 있다.
납중독 검사는 혈액, 머리카락, 소변, 타액에서 납 농도를 측정해 진단한다. 납 중독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 중독의 위험이 있는 어린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6~12개월 이내에 혈액검사를 받아 조기에 진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좋은 치료는 납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 더 이상의 흡수를 막는 것이다. 해독치료가 필요한 경우 △Ca-EDTA(Calcium edetate, calcium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Calcium Disodium Versenate, 일명 칼슘킬레이트, 칼킬레이트) △페니실라민(D-penicillamine) △디메르카프롤(Dimercaprol, British Anti-Lewisite, BAL 또는 BA) △디메르캅토호박산(디메르캅토숙신산, DMSA, meso 2,3-Dimercaptosuccinic acid, 일명 succimer) △디메르캅토프로판설폰산(2,3-dimercaptopropane-1-sulfonate, DMPS) 등을 사용한다.
이들 해독제는 체내 납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각한 납중독으로 인해 전신 경련, 발작 등의 증상이 일어날 경우 해독제로 응급치료를 해야 한다.
Ca-EDTA를 이용한 킬레이션(chelation)은 중금속 해독에 가장 널리 애용되는 방법이다. 납, 수은, 구리, 철, 비소, 알루미늄, 칼슘 등을 포획해 체외로 배출시켜준다. 킬레이션(chelation)은 게의 집게발처럼 뭔가를 꽉 문다는 어원을 갖고 있다.
일부 의사들은 Ca-EDTA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까지 제거해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고 논란이 많다. 칼슘을 흡착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플라크가 축적되는 것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다.
콜레스테롤을 흡착한다고 알려진 킬레이션 제제 중 methyl-β-cyclodextrin(MβCD)은 신경계의 시냅스 기능(synaptic function)을 변경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납중독에서 무증상이면서 혈중 납 농도가 20~70ug/dL에 해당하면 Ca-EDTA를 체표면적 1㎡당 1g을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납 뇌병증 증상이 있거나 그리고/또는 혈중 납 농도가 70ug/dL를 초과하면 체표면적 1㎡당 250mg을 하루 4번 5일간 근육주사한다. 정맥주사로 투여하려면 50mg/kg/day 용량을 24시간에 걸며 점적주사한다. 또는 체표면적 1㎡당 1g을 8~24시간에 걸쳐 점적주사한다. 이 때 디메르카프롤(BAL) 4mg/kg을 하루에 6회(4시간마다 1회)에 근육주사하는 것을 5일간 병행하는 게 원칙이다.
납 신병증이 있으면 500mg/kg/day를 24시간마다 한번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하기를 5일간 계속한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정상치 0.5~1.4mg/dL)가 3~4mg/dL 범위이면 500mg/kg/day를 48시간마다 한번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하기를 3회 반복한다.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4mg/dL를 초과하면 500mg/kg/day 용량을 매주 한번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이같은 일련의 프로세스는 한 달씩의 간격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한 달 치료하고 한 달 휴지기를 갖는 것이다.
Ca-EDTA는 아연 함유 인슐린 제제, 프레드니솔론 또는 코르티손 같은 스테로이드 제제, 아연 보충제 등과 병용할 경우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원칙이다.
페니실라민은 미국에서 ‘Cuprimine’이란 브랜드가 유명하다. 1970년에 미국에서 승인됐다. 주된 적응증은 윌슨병(Wilson's disease, 선천적으로 구리가 과잉 축적돼 간과 뇌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며, 높은 뇨중 시스틴 수치를 보이는 시스틴뇨증(Cystinuria), 시스틴뇨증을 동반한 시스틴 신장결석,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류마티스질환, 중금속 중독(납, 수은) 등에 사용된다. 국내서는 만성간염, 피부경화증에도 적응증을 갖고 있다.
국내 허가된 제품으로는 일동제약 ‘알타민캡슐’이 있다. 성인은 1회 250mg, 1일 3~4회(식사 30분 전 또는 저녁식사 3시간 후) 투여한다. 소아에서는 하루에 체중 kg당 20~30mg을 수회 분할 투여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사항은 소아에서 체중 kg당 10~15mg을 하루에 2~6번 투여하도록 돼 있다.
공복에 복용해야 효과가 크다. 해독을 위해 정해진 양보다 많이 복용하거나,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약을 거르는 것은 금물이다. 하루 정도 약을 거르면 약효가 떨어져 복용 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자칫 알레르기반응이 초래될 수 있다. 의사의 지시대로 정해진 기간을 복용한다. 거의 모든 중금속 해독제는 임신이나 수유 등에 안전하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삼가는 게 좋고 의사와 상의해 결정한다.
어린이는 납 혈중농도가 5ug/dL 이상만 돼도 나쁜 영향을 받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때부터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다. 어린이 기준으로 5~10ug/dL이면 경증, 10~30ug/dL이면 중등도, 30ug/dL 이상이면 중증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에게 45ug/dL 이상이면 최중증에 속한다. 성인 기준으로는 각각 25ug/dL 이하, 25~50ug/dL, 50ug/dL 이상이다.
페니실라민의 투여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납 중독 킬레이션 제제는 납 혈중 농도가 45ug/dL 이상인 경우에 투여한다.
디메르캅토호박산(DMSA)은 납, 수은, 비소 중독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주로 경구용 캡슐 제형이며, 납을 해독하는 게 핵심 작용이다. 테크네튬-99m 방사성 동위원소와 결합(99mTc-DMSA)시켜 핵의학 신장기능 검사, 요로감염 검사 등을 시행할 때도 많이 활용된다.
DMSA는 존슨앤드존슨그룹이 개발해 1991년 1월 30일 어린이의 급성 중증 납중독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CHEMET® 캡슐이 최초다. 승인된 라벨에는 “혈중 납 수치가 45이상~70미만 ug/dL인 어린이의 납중독 치료” 용도로 표기돼 있다. 납중독을 예방하는 용도로는 승인되지 않았다.
처음 5일간은 체중 kg당 10mg(또는 체표면적 1㎡당 350mg)을 하루 3번 투여한다. 이후 같은 용량을 14일간 하루 두 번 감량해서 투여한다. 이처럼 19일 경구 투여한 다음에는 2주간의 휴지기를 갖는다.
5일간 체중 kg당 10mg을 투여하고 1주일 쉬기를 반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디메르카프롤(BAL)은 원래 비소 가스를 없애기 위해 개발됐다. 지금은 비소 외에도 납, 금, 수은 등의 제거를 위해 근육주사하는 제제가 승인돼 있다. 이밖에 안티몬, 탈륨, 비스무트 등의 제거에도 활용된다. 그러나 의학적 사용 근거는 그리 강하지 않다.
상호작용이 있어 카드뮴, 금이 함유된 화합물(auranofin, aurothioglucose 등), 철 함유 염물질 또는 보충제, 셀레늄 등과 병용하거나 이를 해독할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디메르카프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옥스퍼드대학 생화학자들이 개발했다. 본래 루이사이트(Lewisite, 수포를 일으키고 안구를 자극하며 호흡곤란·구토·오심·콧물 등을 야기하는 유기 비소화합물 화학무기)에 대한 폐 해독제로 비밀리에 개발됐다. 과거에는 윌슨병의 치료제(현재 오프라벨 처방)로 사용되기도 했다. 국내에 이 성분의 허가된 약제가 없다.
납중독에서 디메르카프롤은 4mg/kg을 처음 근육주사한 뒤, 이후 같은 용량을 4시간마다 반복 투여한다. 3~5일째에는 디메르카프롤 4mg/kg과 EDTA 250mg/㎡를 병용해 4시간마다 근육주사한다. 만약에 납 혈중 농도가 45ug/dL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5~7일째에 반등하면 병용요법을 반복 시행한다. 또는 EDTA만을 단독으로 반복 투여한다.
디메르캅토프로판설폰산(DMPS)은 DMSA와 함께 디메르카프롤의 모사체다. ‘Unithiol’ ‘Dimaval’이란 브랜드가 유명하다. 1956년에 처음 합성돼 폴로늄-210을 포함한 중금속 중독에 보호효과가 있어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보다는 주로 수은 중독 치료제로 활용된다. 비소, 비스무트 중독에도 활용된다.
납중독에서는 최고용량(체중 kg당 200 마이크로몰) DMPS를 써야 신장, 간, 뼈에서 납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반면 저용량(체중 kg당 25~50 마이크로몰)에서는 신장에서만 납이 배출됐다. 12일간에 걸쳐 총 15.25g을 첫날에는 정맥주사, 이후에는 경구로 분할 투여하면 안전한 양이라고 연구돼 있다. DMPS는 위장관에서 39% 정도만 흡수된다.
이미 체내 수은 농도가 올라간 염화수은(피부미백용 화장품 제조) 취급 근로자에게 DMPS를 투여했더니 체내 수은 부담을 낮추고 소변 내 수은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동물실험에서는 뇌내 무기 수은을 낮추고 조직내 수은을 제거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SJS)을 유발하며 DMPS 투여를 중지하면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수은증기 또는 산화수은으로 인한 수은중독에서 Unithiol 100mg을 하루에 2번, 최대 15일 경구 투여했더니 소변에서 수은 제거 효과가 한층 개선됐다는 7명 대상 임상연구 결과가 있다.
수은중독(Mercury Poisoning)
수은은 치과 종사자(아말감 보철물 취급자), 화학산업 근로자가 많이 사용하는 중금속이다. 배터리, 해산물, 살충제, 수은온도계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다.
수은은 폐, 신장, 뇌,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독 증상으로 피로, 우울증, 무기력, 과민성, 두통 등이 나타난다.
수은 증기 흡입과 관련된 호흡기 증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타는 듯한 흉통 등이 있다. 폐에 영향을 받은 일부에서 비정상적인 체액 축적(폐부종)을 경험할 수 있다. 폐렴이나 폐섬유증도 초래될 수 있다.
수은에 과다노출되면 흥분성, 급한 행동, 집중력 부족, 기억상실 등 행동 및 신경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뇌에 일시적 쇼크와 영구적인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팔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조정하는 능력이 손상된 진행성 소뇌 증후군(운동실조), 느리고 몸부림치는 움직임(무도병적 무정위운동, (choreoathetosis, 사지말단의 불수의적인 움직임)과 결합된 통제되지 않은 급작스러운 움직임 등이 초래될 수 있다.
이밖에 신경의 비염증성 퇴행성 질환(다발신경병증), 소뇌 운동실조(cerebellar ataxia), 혀와 입술의 발작 그리고/또는 구음장애, 기분·행동·의식의 변화도 유발될 수 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의 한 비료공장에서 메틸수은을 무단 방류함으로써 어류와 사람에게 축적된 수은중독 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무기 수은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흥분성 신경과민(erethism) 또는 모자장수증후군(mad hatter syndrome, 19세기 영국에서 모자공들이 값싼 토끼 가죽을 부드럽게 가공하기 위해 수은 증기 처리를 해서 생긴 병)으로 알려진 성격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주로 기억상실, 과도한 수줍음, 비정상적인 흥분 그리고/또는 불면증 등이 나타난다.
수은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시각 문제(시야 수축, 터널 비전, 실명) 및 청력 상실과 같은 감각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일부는 고통스러운 부기, 손가락과 발가락의 분홍색 변색(acrodynia, 말단통증)과 같은 피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피부의 지속적인 발적 또는 염증(홍반), 영향을 받은 부위의 극도의 민감성(감각과민증), 따끔거림과 감각장애 등이 주된 증상이다.
이밖에 신장기능 손상, 탈수, 급성 신부전, 치은염, 구토를 동반한 입과 인두의 심한 국소 자극 그리고/또는 출혈성 설사를 동반한 복부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수은은 주로 소변과 대변을 통해 배설된다. 수은중독은 혈액검사를 통해 수은을 측정하고 생선회나 참치류 등의 섭취력, 직업 등을 고려해 급성인지 만성인지 판단한다.
수은중독이 확인되면 수은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수은과 결합하는 BAL, Ca-EDTA, 페니실라민, DMSA, DMPS 등 킬레이트 물질들을 복용하거나 근육주사나 정맥주사한다.
아울러 수은중독으로 인한 급성, 만성 증상들에 대해 보조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예컨대 호흡곤란이 심하면 산소치료, 미네랄 불균형이 심하면 이를 보충해거나 감소시키는 영양요법, 통증에 대한 진통요법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 보완치료로 신부전에서의 혈액투석, 위세척(gastric lavage) 등을 시행한다.
수은중독에서 디메르카프롤(BAL)은 첫날에 5mg/kg을 한번에 근육주사하고, 2~11일째(10일간)에는 2.5mg/kg을 12시간 또는 24시간마다 근육주사한다.
비소중독(Arsenic Poisoning)
비소는 살충제, 화장품, 제초체, 살균제, 항진균제, 페인트, 유리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비소에서 나오는 가스는 일부 산업용으로 쓰인다.
비소는 산업현장, 오염된 물이나 해산물 해조류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과다노출은 두통, 졸음, 혼란, 발작,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뇌병증, 말초신경병증, 뇌 백질내 모세혈관 주위 출혈, 신경섬유수초(myelin) 손실 또는 결핍(demyelination) 등이 있다. 피부 문제로는 손톱에 가로로 나타나는 흰색 띠(mees’ lines), 피부 부종 등이 있다. 위장관 증상으로는 구토를 특징으로 하는 독감 유사 증상(위장염), 복통, 발열, 간혹 출혈성을 보이는 설사 등이 있다. 다른 증상으로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파괴(용혈), 적혈구의 낮은 철분 수치(빈혈), 저혈압 등이 있다. 어떤 중독자들은 숨을 내쉴 때 마늘 같은 냄새를 풍긴다.
만성 중독의 경우 허약, 근육통, 오한, 발열이 발생할 수 있다. 만성 비소중독의 증상은 노출 후 약 2~8주 후에 나타난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비정상적으로 깊은 주름이 있는 피부가 딱딱해진 반점(각화과다증, hyperkeratosis), 피부의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어두워지는 현상(과다색소침착, hyperpigmentation), mees’ lines, 피부의 염증과 같은 인설(박리성 피부염, exfoliative dermatitis)이 있다. 다른 증상으로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염증(다발신경염), 인후점막의 염증 등이 있다.
무기 비소는 간, 비장, 신장, 폐, 위장관에 축적된다. 이를 통해 피부, 머리카락, 손톱과 같은 조직에 잔류물을 남긴다. 급성 무기 비소 중독의 증상으로는 입과 목의 심한 작열감,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저혈압, 근육경련 등이 있다. 심각한 급성 무기비소 중독이 있는 사람은 심장 문제(심근병증)를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 신장 세뇨관에 산이 축적되는 신세뇨관산증(renal tubular acidosis), 용혈, 심실 부정맥, 혼수, 발작, 장출혈. 황달(피부, 점막, 눈 흰자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비소는 급성 중독일 경우 황산철, 산화마그네슘, 디메르카프롤(BAL) 등을 사용한다. 만성중독에는 BAL을 쓴다.
비소중독에서 BAL은 1~2일째에 10~12mg/kg/day를 6시간마다 근육주사한다. 3~5일째에는 5~6mg/kg/day를 12시간마다 근육주사한다. 4~14일째에는 2.5~3mg/kg를 하루 한번 근육주사한다.
카드뮴중독(Cadmium Poisoning)
카드뮴은 전기도금, 축전지, 증기램프, 납땜질, 흡연 등의 과정에서 중독이 발생하게 된다. 1912년 일본 도야마현의 진즈강 하류에서 대량의 카드뮴이 노출돼 뼈에 축적되어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Itai-itai disease, 일본말로 이타이는 ‘아프다’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증상 발현은 노출 후 2~4시간 정도에 나타난다. 과다노출되면 피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복부경련, 설사, 발열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점진적인 폐기능 상실(폐기종), 폐부종,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타액 분비가 늘어날 수 있다. 치아의 황변, 빈맥, 적혈구 내 철분 수치 감소(빈혈), 이로 인한 청색증, 후각장애 등이 동반된다.
카드뮴중독은 유독한 중금속 가운데 유일하게 또렷한 해독치료가 없다. 강력한 항산화제(glutathione)를 정맥주사에 체외로 배설시키는 방법이 동원되지만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크롬중독(Chromium Poisoning)
3가 크롬은 주로 자연계에서 발생하고 비교적 안정하고 인체에 무해하나, 6가 크롬은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며 수용성으로 인체에 친화적이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크롬은 자동차, 유리, 도자기, 리놀륨(linoleum, 화학장판) 제조에 사용된다. 크롬에 과다노출되면 폐암, 호흡기암, 신장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설사, 구토(종종 출혈성) 등의 위장 증상과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각한 물-전해질 장애, 혈액 및 신체 조직의 약한 산성도 증가(산증) 그리고/또는 조직으로의 부적절한 혈류로 인해 쇼크를 초래할 수 있다. 신장, 간, 심장근육에도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마땅한 치료법은 없다. 다만 급성 6가 크롬 중독의 중화제로 황산철(ferrous sulfate), 이산화황(sulfur dioxide), 황산수소나트륨(sodium bisulfate) 등이 투여될 수 있다. 체액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며 증상에 따른 보완요법, 대증요법을 시행하는 게 치료의 하나다.
코발트중독(COBALT POISONING)
2차전지, 제트엔진 제조에 사용되는 코발트는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거식증), 이명, 신경 손상, 호흡기질환, 비정상적 갑상선비대(갑상선종) 그리고/또는 심장질환 그리고/또는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코발트중독 치료제로는 DMPS를 투여한다. 코발트를 삼켰을 때 신장에 대한 혈액투석이 시행된다. 코발트의 피부 접촉에 의한 피부염은 진정보습제 크림 정도로 완화한다.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은 관련 대증 약물이 처방돼야 한다.
과거에 코발트 재질의 인공관절은 장기간 독성을 나타내는 문제가 심각했다. 코발트 재질의 인공관절은 독성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현재는 티타늄, 세라믹 등 인체친화적인 재질의 인공관절이 보급돼 큰 문제는 없다.
망간중독(Manganese Poisoning)
망간은 여러 금속 생산 시 정련제로 사용된다. 철 속의 산소와 황을 제거하고, 철과 합금돼 강도를 높인다.
망간은 주로 광산이나 제철소에서 채굴, 분리, 정련하는 과정에서 중독되기 쉽다. 과다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손상,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 허약, 피로, 혼돈, 환각, 이상하거나 어색한 보행 및 사지 움직임, 근육연축(근육긴장), 경직, 손 떨림, 정신과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Ca-EDTA와 결핵약인 파라아미노살리실산(para-aminosalicylic acid, PAS)을 병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EDTA 치료는 소변 내 망간 배설을 증가시키고 혈액 내 망간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상 증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17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PAS는 상당한 작업능력 및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리기전은 불분명하지만 EDTA가 혈액-뇌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반면 PAS는 킬레이션 기능이 있으면서 이를 통과할 수 있어 뇌실질내 생체이용률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DTA는 손상된 뉴런을 복구하는 능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PAS가 이를 보완하는 적합한 약물로 권고되고 있다.
이밖에 철분이 고함량 함유된 식단이 망간의 흡수를 억제하며,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이와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쥐 실험에서 망간에 중독된 쥐에게 타우린(Taurine) 투여로 학습 및 기억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타민E, 글루타치온, N-Acetylcysteine(NAC), 멜라토닌(Melatonin), 퀘르세틴(Quercetin) 등은 인체 또는 동물실험에서 망간중독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