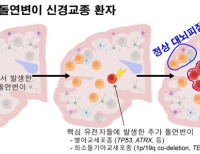2025년도 노벨생리의학상은 매리 브런코(Mary E. Brunkow, 64) 미국 시애틀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선임 연구원, 프레드 람스델(Fred Ramsdell, 65)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노마바이오테라퓨틱스(Sonoma Biotherapeutics) 고문, 사카구치 시몬(Shimon Sakaguchi, 74) 일본 오사카대 석좌교수 등 세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지난 6일, 이들이 ‘말초 면역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 관련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자가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말초 면역관용은 “수상자들의 발견은 자가면역질환이나 암 같은 질환에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 새로운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다.
이들은 면역 체계가 외부의 적을 공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공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즉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 Treg) 의 원리를 밝혀냄으로써 자가면역질환 연구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꿨다.
정상적인 면역은 단순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시간과 방법을 잘 아는 것이다. 면역체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그 칼날이 거꾸로 자신을 향할 때 류마티스관절염, 제1형 당뇨병, 전신홍반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고통받게 된다.
사카구치는 1990년대 초, 기존 면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던 현상인 “왜 어떤 T세포는 대부분의 T세포와는 다르게 오히려 면역반응을 억제하는가?”에 주목했다. 그 결과, 그는 조절 T세포(Treg) 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었다.  202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매리 브런코(왼쪽부터), 프레드 람스델, 사카구치 시몬 교수(출처 노벨상위원회 유튜브 채널 캡처)
202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매리 브런코(왼쪽부터), 프레드 람스델, 사카구치 시몬 교수(출처 노벨상위원회 유튜브 채널 캡처)
이후 미국의 브런코와 램스델은 희귀한 자가면역성 생쥐 모델을 통해 이 T세포에서 Foxp3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 조절인자임을 밝혀냈다. Foxp3 유전자의 결함과 이상은 면역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면역상태, 즉 자가면역질환을 초래한다. 세 과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자가면역질환은 단순히 공격성 과잉 면역의 문제도 있었지만, ‘면역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도 중요한 원인임을 밝혔다.
이 발견 이후, 전 세계 자가면역 연구는 단순히 ‘면역 억제’가 아니라 ‘면역 균형 회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예전의 치료제들은 면역반응 광범위하게 억제하여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조절 T세포를 강화해 필요한 면역은 살리고, 과도한 면역만 조절하는 선택적 접근전략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환자 자신의 조절 T세포를 확장하거나, iPSC에서 유래한 CAR-Treg 세포치료제로 이식 거부반응이나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노벨상은 단순히 면역조절세포 하나의 기능을 밝힌 연구가 아니라, 인간 면역계가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철학적 기준을 제시한 상징적 사건이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공격하는 상태”이고, 조절 T세포는 “그 기억을 되찾게 하여 공격을 멈추게 하는” 생체 내의 조화 메커니즘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CAR-Treg 혹은 iPSC-Treg 기반 치료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장기이식, 자가면역질환 등에서 조절 T세포의 조절기전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완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2018년 제임스 알리슨(James P. Allison) 교수와 다스쿠 혼조노벨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에 사카구치 시몬 교수의 수상으로 ‘면역활성’과 ‘면역관용’이라는 두 축의 균형이 인류 건강의 본질적 핵심임을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는 “사카구치 교수가 재직한 오사카대학을 방문했더니 뛰어난 인력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시설, 전폭적인 정부지원을 보고 크게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꾸준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1987년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가 ‘항체 생성의 유전적 원리’로 첫 수상을 한 데 이어 2012년엔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가 유도만능줄기세포. 2015년 오무라 사토시 도쿄대 이과대학 교수가 선충 기생에 의한 감염병,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도쿄대 이과대학 교수가 오토파지(autophagy) 현상, 2018년 혼조 다스쿠(Tasuku Honjo) 교토대 교수가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 연구로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주지현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자가면역질환, 암 면역치료, 장기이식 등 여러 분야의 치료 전략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업적이 노벨상 수상으로 귀결됐다”며 “‘면역의 브레이크를 찾아낸 사람들’이 자가면역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말헀다.
수상 상금은 총1100만 스웨덴크로나(약 16억5600만원)으로 이번 수상자 3인은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