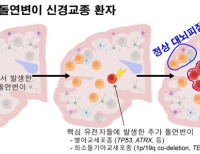유전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도구를 활용해야 더 효과적인 치료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 공선영 진단검사의학과 교수팀은 대구가톨릭대 간호대와 공동으로 유전성 암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도구의 개발현황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유방암, 난소암, 대장암 등 유전성 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검사, 예방적 (절제)수술, 자녀 계획, 가족에게 정보 전달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복잡한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수술 및 항암 치료와 같은 암 치료 방향뿐 아니라, 삶의 방식, 가족의 유전검사, 미래 자녀 계획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큰 심리적 부담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도구(Decision Aid Tool)가 개발돼 활용되고 있지만, 도구의 개발 현황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은 국내 유전성 암환자와 가족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개발된 23개의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대상으로 개발 현황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확인했다.
첫째, 유전상담 이외에 의사결정 도구를 함께 활용할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 역량이 향상되고, 의사결정에 대한 갈등은 줄어들며 선택에 대한 만족이 증가했다.
둘째, 유전성 유방암 및 난소암 여성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다른 유전성 암, 남성 환자, 가족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는 매우 드물었다.
셋째, 전체 의사결정 지원도구의 81% 이상이 북미와 유럽에서 개발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에서는 실제로 활용 가능한 의사결정 지원도구가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인 박선영 대구가톨릭대 간호대 교수는 “유전성 암 환자와 그 가족이 마주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도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종합 연구로, 지금까지의 의사결정 지원도구는 서양 중심, 백인 여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왼쪽), 공선영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이번 연구엔 정소연, 공선영 교수가 책임연구자를 맡았고 김연주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최윤정·유금혜 교수(암예방검진센터), 이은경 교수(유방암센터)가 동참했다. 채희정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박선영 교수, 김유림 고신대 간호대 교수, 스위스 바젤대 간호대 마리아 카타포디(Maria C. Katapodi) 교수가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국립암센터가 주관한 ‘암생존자 헬스케어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유전의학 학술지인 ‘제네틱스 인 메디신’(Genetics in Medicine, IF 6.9)에 최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