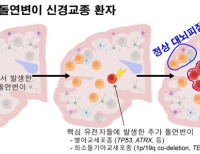중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이 놀라운 기세로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아직은 양적, 질적 지표에서 미국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평가되지만 추월할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이지 십수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를 국가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3단계 전략 중 그 1단계가 2025년 종료된다. 이 전략은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해양공학, 고속철도, 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 10대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것인데 이 중 제약바이오가 끼어 있다. 2025년까지 이들 분야의 중국산 부품 및 소재 비율을 70%로 끌어올리자는 게 구체적 목표다.
현재 중국이 로봇, 항공우주, 전기차,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는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국 제조 2025의 산물이다. 예컨대 올해 1월 중국산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가 저렴한 비용으로 최단 개발기간 안에 오픈AI의 ‘챗GPT-4’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준 것은 AI시장의 지각 변동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광양회(韜光養晦)와 대국굴기(大國崛起)를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진행 중인 암, 체중감량 등 신약개발 프로젝트는 작년에 1250개를 돌파해 유럽연합(EU)을 훌쩍 넘어섰고, 약 1440개에 달하는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다, 글로벌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의 약 4분의 1을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선 매년 약 3000개의 프로젝트가 임상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3년에는 4300건의 임상시험이 중국에서 진행됐으며 이 중 2323건이 신약과 관련한 것이다. 또 1750건이 항암제 관련이고 나머지는 주로 내분비질환, 심혈관질환 등 만성 고령화질환에 집중돼 있다.
같은 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운영하는 ‘ClinicalTrials.gov'’에 신규 등록된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건수는 4470건으로 이 중 미국이 22.02%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지만 중국도 13.59%로 2위에 랭크됐다. 중국이 2021년 9.21% 비중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2년만에 급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CAR-T 등) 개발에서도 중국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 이 분야 임상시험이 81건으로,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제하면서 압박하자 중국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및 외국인 인재 영입, 과학자에 대한 연구개발 재량권 부여, 규제 완화로 대응한 게 이런 성과를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7월 10일, 항생제 등 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정샤오위(63) 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국장(한국의 식약처장 격)에 사형을 집행하면서 혁신 의지를 알렸다.
2015년에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품질 기준을 강화하며,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의약품 승인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당시 중국 혁신의약품(신약후보물질)의 글로벌 수준 파이프라인은 160개에 불과했다. 이는 전세계 6%에 못 미치는 수치로, 미국 유럽연합을 제외한 단일국가로는 일본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대략 4분의 1(25%)를 점유하고 있다.
미국 컨설팅기업 노르스텔라(Norstella)의 리더십 부사장인 다니엘 챈슬러(Daniel Chancellor)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글로벌 수준 파이프라인이 양적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과장된 게 아니다”고 말헀다. 이는 제네릭, 개량신약(제형 개선, 복합제),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한 혁신신약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기에 더욱 놀라울 일이다.
더욱이 중국은 경쟁국을 압도할 생산능력,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발굴 플랫폼이 탄탄하다. 앞으로 ‘팔아 먹을만한 매력적인’ 신약의 탄생이 넘쳐날 것이란 기대가 결코 허상이 아니다.
양적 지표는 물론 질적 측면에서도 중국의 도약은 놀랍다. 과거에 중국의 임상시험 데이터는 부실하고 조작이 많고 인권유린의 흔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인을 위주로 한 피험자 구성 때문에 세계적 신약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늘 따라다녔다.
하지만 몇 년 새 이에 대한 시각은 많이 달라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을 비롯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기관들이 중국산 신약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산 신약후보가 우선심사, 희귀의약품, 혁신치료제,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되는 건수가 현저하게 늘었다.
중국 혁신의 초기 사례 중 대표적인 게 레전드바이오텍(Legend Biotech)에서 개발하고 현재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이 판매 중인 BCMA 표적 CAR-T 혈액암 치료제인 ‘카빅티’(Carvykti, 성분명 Ciltacabtagene autoleucel)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아베크마’(idecabtagene vicleucel)와 노바티스의 ‘킴리아’(tisagen lecleucel)보다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준시바이오사이언스의 PD-1 억제제 ‘록토지’(Loqtorzi, 성분명 Toripalimab)이 2023년 11월에, 비원메디슨(옛 베이진)의 PD-1 억제제 ‘테빔브라주’(Tevimbra, 성분명 tislelizumab)이 2024년 3월에 각각 미국에서 승인받았다.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이 쥐락펴락하는 면역관문억제제 시장에 뒤늦은 진출이지만 고유의 적응증과 가격경쟁력으로 얼마나 많은 시장을 잠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개발된 면역관문억제제 계열 항암제는 1건도 없다. 개발하겠다는 집념, 전략, 인재, 자본의 총체적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물론 미국에서 인정받은 중국산 혁신신약의 절대 수는 아직 미국산 약물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 제약산업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는 한국 등 대다수 후발국이 갖는 취약점이다. 실패 위험이 높은 신약개발에 도전하는 일은 여전히 미국, 유럽,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중국 혁신신약의 싹은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고 있다. 초거대 신약 라이선스 매각이나 제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아케소(Akeso)는 2022년 10월, 미국 서밋테라퓨틱스(Summit Therapeutics)와 최대 50억달러 규모의 계약(이중 선불계약금은 5억달러)을 맺고 유망한 PD-1 및 VEGF 이중표적항체 신약후보물질인 ‘이보네시맙(ivonescimab)의 중화권 외 글로벌 독점권을 매각했다. 이보네시맙은 키트루다를 뛰어넘는 약으로 주목받으며 글로벌 몸값이 최근 150억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다. 판권을 보유한 서밋테라퓨틱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등 글로벌 빅10급 제약사에 이를 재매각할지 고민 중이다.
미국 머크(MSD), 아스트라제네카, 로슈 등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중국 자산을 인수하고 있다.
지난 5월, 화이자는 중국 3SBio의 PD-1/VEGF 이중 특이성 ‘SSGJ-707’에 대한 중국 외 라이선스 권리를 지난 5월, 2억5000만달러 선불 계약금에 사들였다. 마일스톤을 포함한 금액을 합치면 60억5000만달러로 아케소가 서밋에 매각한 금액인 50억달러를 뛰어넘었다.
이러한 수준의 중국 제약기업과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 간 거래는 규모와 빈도 면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산 신약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상당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다국적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스텔라는 “중국에서 나오는 잠재적 신약후보 수가 많다는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추가해야 하는 다국적기업의 성향 상 반가운 일이며, 점차 중국산 파이프라인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의 라이선스 거래의 약 3분의 1이 중국 기업과의 거래였으며, 이는 2022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중국 바이오기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실험실실험과 동물실험에서 인체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더 저렴하고 빠르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서구 제약사들은 신약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악명 높은 과정이라고 여기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방대한 환자 풀과 중앙 집중화된 병원 네트워크는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아직은 경제적, 의료 수준이 일천한 중국에서 암 및 비만 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의 경우 미국보다 절반의 시간 안에 환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중국의 임상시험 관리기업은 의뢰만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여력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 중국에서 높은 임상 유효율이 나오는 것은 중국의 환자 풀이 ‘저치료’(Under treatment) 또는 ‘무치료’(naive)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치료경험이 있는 서구나 신흥개도국에 비해 치료성적이 좋아서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상연구의 이점은 비용과 시간을 줄여야 하는 다국적사의 입장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이런 임상시험 연구의 중국 진행 증가는 2021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규제 당국(FDA)은 아무리 데이터가 긍정적이더라도 중국에서만 진행된 임상 결과만으로는 약물 승인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표적인 게 2022년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항암제자문위원회(Oncologic Drugs Advisory Committee, ODAC)가 미국 릴리와 중국 이노벤트바이오로직스(Innovent Biologics·信達生物制葯)의 PD-1 억제제인 ‘타이비트’(Tyvyt, sintilimab)의 승인을 거절한 것이다. 단일 인종 피험자가 너무 많은 것을 문제삼았다. 다른 부수적 문제도 제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 일변도의 피험자 구성이다.
해외에 신약을 판매하려는 야심 찬 중국 바이오테크기업들은 복잡하고 진행 속도가 느린 글로벌 임상연구를 통해 중국 외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가 재현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중국 신약의 상용화에는 수년이 더 소요되긴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극복해야 할 과정이다.
중국의 혁신 제약기업에는 외국에서 교육받은 기업가가 설립한 첨단 바이오업 스타트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최대의 제네릭 의약품 제조기업인 장쑤항서의약(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江蘇恒瑞醫葯)처럼 오래된 회사들도 가세하고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최대 12개의 혁신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 장쑤항서의약과 제휴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에 따라 GSK는 선불 계약금 5억달러를 지급키로 했다. 12개 혁신치료제에 대한 옵션이 행사되고, 전체 성과금이 지급될 경우 장쑤항서의약은 약 120억 달러의 마일리지를 지급받게 된다. 개발 대상 프로그램들은 호흡기치료제, 면역계 및 염증질환(I&I) 치료제, 항암제 등이다.
중국 보건당국이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으로 수익성이 저하되자, 장쑤항서제약은 혁신적인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2020~2024년의 신규 파이프라인 수가 전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과를 일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적 약물 후보를 가장 많이 개발한 50개 기업 중 20개가 중국 기업이다. 반면 그 이전 5년 동안은 중국기업이 5개 기업에 불과했다.
앞으로 중국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고품질 혁신을 이룰 것이란 전망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트업부터 기성 제약사까지 혁신의 훈풍이 진취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약진을 견제할 미국으로서는 이를 기술 대 기술, 혁신 대 혁신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국가안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미국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중국에게 주도적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생물보안법 입법 시도’(발의됐지만 통과 안 됨) ‘미국 상무부를 통한 적대국(중국 등)에 대한 높은 의약품 의존도 개선을 위한 관세 인상’ ‘중국 등에서 미국인 세포 및 유전자를 변형한 임상시험 금지’ 등 바이오 강국으로서는 옹색한 대응만 내놓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발의한 법안으로, 적대국의 바이오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주요 바이오기업들의 기술 및 서비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게 생물학적제제를 위탁생산하는 중국의 우시앱텍 및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인데 이 법안의 발의 진행과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 로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연구원 잭 번햄은 “바이오테크는 미·중 기술 경쟁의 최전선 중 하나”라며 “바이오테크의 경제적 영향과 군사적 활용 가능성 외에도, 미국인의 높은 중국 의약품 의존도는 장차 미래의 분쟁에서 중국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정부가 과학장비 수출통제 및 투자장벽과 같은 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바이오테크 성장을 저해하고, 임상시험 규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 바이오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Make American Biotech Accelerate, MABA)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집계된 미국과 중국의 신약 허가 개수를 보면 과연 이런 의지 표명만으로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경쟁 우위가 극복될지 의문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5년 상반기 43개의 혁신신약을 승인하여 전년 동기 대비 59% 급증했다고 밝혔다. 내용 면에서도 신약 중 다수는 종양, 대사질환, 면역질환 등 만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다. 중국 최초의 혈우병 B 유전자 치료제인 Belief BioMed의 AAV 유전자 치료제 ‘BBM-H901 주사액’이 지난 4월 10일 승인받았고 △면역·대사질환 치료용 희귀약 △줄기세포 치료제 △신형 항인플루엔자 치료제 등 고난도 미충족 임상적 수요에 대응하는 약물들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희귀질환 치료제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연구·승인도 적극 장려 중이다. NMPA는 ‘돌봄 계획(关爱计划)’과 ‘별빛 프로그램(星光计划)’ 등을 통해 해당 약물에 대해 우선심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70개의 소아 의약품과 21개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승인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국은 구조조정 및 예산삭감의 여파로 신약 개발과 승인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FDA는 총 16개의 신약을 승인했으며, 이는 2024년 상반기(21개) 대비 5개 감소한 수치다. FDA는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약 3500명의 직원을 해고했으며, 일부만 재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NIH 예산을 2025년보다 40% 줄인 275억달러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의회예산처(CBO)에 관련 영향을 분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CBO는 NIH 예산이 10%만 감소해도 향후 30년간 임상 1상 진입 후보물질이 30개 줄고, 매년 출시되는 신약 수가 4.5%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FDA의 신약 허가기간이 9개월 연장될 경우, 향후 30년 동안 승인되는 신약은 총 23개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미국 제약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6월 18일 미국 나스닥 스타일의 상하이 스타마켓(STAR Market)에 아직 수익성 없는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계층’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 1일에는 그 첫 케이스로 우한의 허위안바이오테크놀로지(Wuhan Heyuan Biotechnology)의 상장(IPO)을 승인했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National Healthcare Security Administration)과 국가위생건강위원회(National Health Commission)는 지난 7월 1일 ‘혁신 약물의 고품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혁신약물 개발을 위한 의료보험 데티어 사용 지원 △민간 건강보험회사의 혁신익약 개발 장기투자 지원 △혁신약물 지원을 위한 환자자본 육성 △국가급여의약품목록에서 포함되지 못하는 고가 혁신의약품이 상업용(민간) 건강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업 건강보험 혁신의약품 카탈로그(등재)’ 작성 허용 등이다.
중국은 미국을 공격하려 다양한 창을 쑤셔대고 있는데, 왠지 미국은 이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제약산업은 기초과학, 의학, 화학, 공학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산업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질병에 신음하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숭고한 산업일 수 있다. 경제의 관점에서는 리스크도 높지만, 부가가치가 엄청난 산업이다.
중국은 대국굴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쇠퇴기에 접어들어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은 고작 ‘바이오시밀러’ ‘개량신약’ 운운하며 리스크를 회피하고 글로벌 대양으로 나가길 꺼려하는 조각배인가.
때마침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이 미국의 바가지 씌우기를 막아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데 국내 제약산업은 미국의 덕을 볼 것인가, 실을 입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