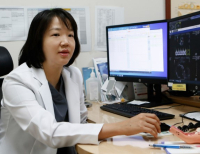2022년 국내 암 사망자 수는 8만3378명이다. 그 중 폐암 사망자 수는 1만8584명으로 약 22.3%를 차지한다. 암환자 4명 중 1명이 폐암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암 사망자수 1위인 ‘폐암’ 병기 구분 없이 방사선치료 활용도 높아져
공문규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폐암 치료는 1기에서 2기까지는 외과적 절제술, 3기는 방사선 치료, 4기는 항암약물치료를 시행하나 주로 3기 이상인 상태로 폐암이 진단돼 방사선 치료를 먼저 접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최근 1기에서도 방사선 치료(정위적 방사선 수술)가 외과적 절제술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입증돼 폐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시행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폐암 방사선 치료는 강한 에너지의 레이저 빔으로 암 세포의 DNA를 파괴시켜 암세포를 사멸시킨다. DNA가 파괴돼 사멸된 암세포들은 체내 면역반응에 의해 흡수된다. 하지만 모두 흡수되지는 않고 일부는 섬유조직으로 변형된 채 남아있다.
공문규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공 교수는 “사멸된 암세포가 변형된 섬유조직은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일종의 흉터로 넘어지거나 다쳐 생긴 큰 상처가 아물어도 흉터가 남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며 “방사선 치료 시작 3개월 후부터 1년 정도까지는 크기가 커질 수 있으나 섬유조직 내에 살아 있는 암세포는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사선치료 후 생긴 흉터조직, 재발암 의심보다 정확한 검사와 신중한 판단 중요
변형된 섬유조직은 흉부 X-선 혹은 CT 촬영 시 불규칙한 경계를 갖는 흰 음영으로 보인다.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 방사선치료 후 3~4년이 지난 시점까지 흉터조직의 크기가 커지기도 한다.
공 교수는 “CT상 흉터조직과 재발암이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중요하다”며 “재발된 폐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모든 치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흉터 조직을 재발암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여부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사선치료 후 암덩어리와 그 주변조직이 섬유화되면서 흉터조직으로 변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재발암은 CT소견 상 비교적 균일한 경계를 보이는 반면, 흉터 조직은 불규칙한 경계를 보인다는 사실도 중요한 감별 포인트다.
공 교수는 “CT 소견만으로 감별하기 애매모호하다면 PET-CT를 추가로 찍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재발암은 PET-CT에서 밝게 보이지만, 흉터조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쉽게 감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발암이라는 확신이 들더라도 바로 치료를 시행하지 말고, 가능하면 확진을 위해 조직검사 시행을 권고했다. 조직검사 없이 재발로 판단해 치료를 시행했다가 나중에 재발암이 아닌 흉터조직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