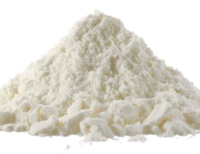동아제약의 ‘박카스’(왼쪽)와 영진약품의 ‘영진구론산바몬드액’
동아제약의 ‘박카스’(왼쪽)와 영진약품의 ‘영진구론산바몬드액’
제약업계 사람을 만나면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 본다. 자양강장제 중 동아제약의 ‘박카스’와 영진약품의 ‘영진구론산바몬드액’ 중 어떤 게 먼저 나왔냐고 물으면 대부분 박카스를 먼저 떠올린다. 이 질문은 박카스가 정답이다. 박카스는 1961년, 영진구론산은 1964년에 출시됐다. 박카스가 처음엔 정제로 판매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1963년에야 드링크로 나왔다. 그러나 알싸한 박카스와 달리 영진구론산은 부드럽고 혀끝을 만족시키는 향미가 좋아 박카스보다 우위를 갖는 브랜드였다. 지금 대다수 젊은이들이 영진구론산을 모르거나, 기성세대 상당수도 박카스의 아류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는 생판 다른 형국이었다.
이들 두 사례를 보면 시장에서의 승리는 제품의 질이 아니라 광고홍보에 달렸다는 게 공통분모다. 벽산그룹도 영진약품도 과거 홍보에 집중하지 않던 회사들이다. 당시 재계 상위 그룹에 속했던 두 회사는 광고보다 영업에 주력했다.
이런 생각은 제약사 오너들도 마찬가지다. 영업 효과는 당장 몇달 안에 매출로 돌아오지만 광고나 홍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제약사들은 홍보를 경영을 위한 일부로 봐 독립적인 부서가 아니라 영업지원부서 중 한곳에 배속시키기도 한다.
D제약의 경우 부서장이 회계전문가로 홍보에 지출되는 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항간의 평이 나돈다. 외자사인 N사도 툭하면 광고·홍보 경비를 줄이기 일쑤다. 홍보실은 광고 게재뿐만 아니라 기자 관리에도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경비 축소로 인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 H제약사의 홍보이사가 사직했다. 이유는 계열사의 정보가 새나가면서 대응을 잘 못했다는 게 화근이었다. 이 회사는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광고홍보비를 급격히 줄였고, 예전과 달리 언론매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러다가 계열사의 실수에 의한 정보 누출을 막지 못한 책임이 본사의 홍보이사로 돌아가 억울한 사직을 당해야 했다. 광고홍보를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구색 맞추기로만 생각하는 오너의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없는지 묻고 싶다.
1960년대 광고를 했던 10개 기업 중 동아제약이 1위였고 그 뒤를 한일약품·한독약품·유한양행·종근당·일동제약·한국화이자 등이 이었다. 해태제과와 럭키가 간신히 10위 안에 들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최근 제약사들의 광고홍보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광고홍보는 회사의 영위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제약사 오너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