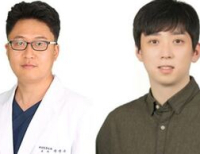유전자치료(遺傳子治療, gene therapy)란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교정함으로써 질병을 고치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환자의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체 구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의료절차를 말한다.
모든 결함이 있는 유전자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유전질환은 단일염기서열변화(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단일염기다형성), 유전자의 결실(누락), 복제(중복), 전좌(염색체의 일부가 다른 염색체로 옮겨 감) 등의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난다. 이를 치료하려면 병적 유전자를 대체하거나, 누락된 유전자에 정상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돌연변이 유전자를 비활성화(knock out 또는 knock down)시켜야 한다.
체세포에만 변이가 생기면 DNA가 영향을 미치는 부위에만 병이 일어나며 후대로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생식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후대가 병을 물려받게 된다.
유전자치료는 유전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지만 아직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회적 또는 윤리적 문제로 논란이 되는 ‘실험적’인 치료기술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유전자치료 효과는 일관되지 않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바이러스 벡터(유전자 운반체)를 쓰는 과정에서 감염, 과도한 면역반응, 발암 과정 유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또 표적을 놓친(Off-target) 나머지 다른 유전자나 건강한 세포에 영향을 미쳐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유전자치료는 1980년대부터 시도돼 1990년대에 들어서 미미한 성공 사례들이 보고됐지만 막상 상용화된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기준으로 2017년 12월 18일에 허가된 ‘레버선천성흑암시(Leber congenital Amaurosis, LCA)’ 유전자치료제인 노바티스의 ‘럭스터나’(Luxturna, 성분명 Voretigene neparvovec-rzyl)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허가됐다는 정보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
유전 과정에 대한 기초지식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최소한의 DNA 연결 형태를 유전자라 한다. DNA는 유전정보의 원형이다. RNA 중합효소는 유전정보의 주형이 되는 DNA 사슬과 상보적인 리보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하여 mRNA(전령 RNA)를 만든다. 이 과정을 전사(轉寫; transcription)라고 한다.
mRNA의 염기서열은 세 개 씩 짝을 이뤄 코돈(codon)을 형성한다. 리보솜에서 tRNA(운반 RNA, 또는 전이 RNA)는 코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상보적인 염기서열(안티코돈, anticodon)을 형성한다. 이를 번역(飜譯, translation)이라고 한다. tRNA 사슬의 끝에 해당 아미노산이 달려 있다. 이런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리보솜 안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보솜RNA(rRNA, 합성RNA)이다.
유전자치료의 분류
교정할 세포의 종류에 따라 체세포 유전자치료(Somatic gene therapy)와 생식세포 유전자치료(Germline gene therapy)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특정 기관 또는 조직에 생긴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는 것이다. 후세대에 치료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 후자는 난자, 정자, 수정란을 사용해 교정된 유전자를 갖춘 개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한 유전적 변화(치료 효과)는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윤리적 논란을 야기한다. 호주,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생식세포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연방정부의 통제가 없다. 미국조차도 연구의 자유는 상당하지만 아직 승인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
기존 체세포 유전자치료제가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점, 주기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특성을 보인다면 줄기세포의 자기재생능력을 활용해 유전자치료에 접목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줄기세포에 이식된 유전자는 오랜 기간 체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투여 주기를 늘리거나, 반영구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현재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신경줄기세포(neural stem cell),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이용한 치료법이 모색되고 있다. 블루버드바이오의 ‘진테글로’ ‘스카이소나’ 등이 줄기세포에 유전자를 이입한 치료제다. 현재 상용화된 순수 줄기세포 치료제 들은 주로 특정 암, 혈액질환, 자가면역질환에서 대안의 하나로 투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를 교정하는 위치에 따라 3가지로 나눈다. 생체외(ex vivo)는 환자의 몸에서 병든 표적세포를 꺼내 교정해서 다시 생체내로 투여하는 방법이다. CAR-T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정교한 유전자 조작이 필요하고 시행 후 면역거부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게 단점이다.
생체내(in vivo)는 환자의 몸에서 잘못된 DNA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바이러스또는 비 바이러스 벡터(vector, 유전자 운반체)를 이용해 표적한 유전자에 정상 유전자(DNA) 또는 RNA를 환자의 유전체에 도입시키는 방법이다. 주로 쓰이는 바이러스 벡터의 경우, 인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작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DNA를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유전자치료의 잠재적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유전자치료에는 대부분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AAV) 및 렌티바이러스(lentivirus)를 벡터로 사용한다. AAV는 면역원성이 낮고, 세포와 조직에서 유전자 도입 효율이 높아, 유전자 도입의 도구 또는 유전자 치료의 도구로 사용된다. Adenovirus, Retrovirus, Lentivirus보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체로 AAV는 유전자 주사제 치료에 활용되는 렌티바이러스는 환자에서 추출한 세포의 유전자를 체외에서 다룰 때 쓰인다.
하지만 AAV는 어떤 사람들에서 기존의 면역방어를 촉발해 유전자치료에 부적격한 환자 또는 좋지 않은 신약후보를 만들 수 있다. AAV는 세포내 episome(plasmid의 일종, 염색체 의존성 증식과 염색체 독립적 증식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유전단위) 같은 데서 머무르며 표적세포의 게놈에 통합되지 않는다.
반면 렌티바이러스는 자신의 DNA를 전달하기 위해 표적세포의 게놈에 직접 통합돼(결합해) 매우 안정적인 유전자 발현 양상을 보여준다. 렌티바이러스의 이런 특성은 어떤 면에서는 유용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바이러스벡터의 성능 개선은 1999년 벡터 실험 도중 사망한 제시 겔싱거(Jesse Gelsinger, 1981~1999) 사후 이후에 크게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이 생명공학 전문가들의 자탄이다.
유전자치료는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원인 유전자)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를 병적 유전자에 도달시키는 운반체(벡터) △유전자치료제를 전달해야 하는 조직이나 세포(목표지점)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2010년대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 유전자편집 방식도 대체로 ex vivo(in vitro)이다. 바이러스 벡터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정교하게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in vivo 방식으로 성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 실패하는 중이다.
병소내(in situ) 유전자치료는 벡터가 병든 조직에 직접 침투하는 방식이다. in vivo에서는 주로 혈액을 통해 벡터가 병든 세포를 찾아가는 반면 in situ는 벡터가 해당 조직에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조직에 적합한 투과력과 유전자 전달능력을 갖춰야 한다.
현재 FDA에서 가속승인 같은 조건부 승인 말고 정식으로 승인한 유전자치료제는 없다. 그만큼 유효성과 안전성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다. 다량의 유전자를 이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일유전자의 결함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제만 승인돼 있다. 겸상적혈구증가증(겸상적혈구빈혈), 선천성 흑내장증(실명), 혈우병(지혈장애), 뒤센근이영양증(DMD), 척수성근위축증(SMA) 같은 질환에 승인된 치료제가 집중돼 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FDA가 승인한 유전자치료제를 중심으로 각각의 작용기전, 적응증, 효과, 한계점을 설명한다. 순수 세포치료제는 제외했고, 유전자치료제와 관련된 안티센스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ntisense oligonucleotide, ASO),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 CAR-T), 소간섭RNA(small interfering RNA, siRNA)를 추후 부연해서 소개한다.
⑴노바티스 ‘럭스터나’(Luxturna, Voretigene neparvovec-rzyl)
2017년 12월 18일, 미국 스파크테라퓨틱스(Spark Therapeutics)가 개발한 ‘레버선천성흑암시(Leber congenital Amaurosis, LCA)’ 유전자치료제인 ‘럭스터나’가 FDA 사상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 질환은 RPE65 유전자에 이중대립형(biallelic, 하나의 유전자에 두 개의 변이, 보통 부계와 모계에서 각각 하나씩 유래) 유전자 변이로 인한 망막이영양증으로 중증의 시력장애가 이른 나이에 찾아와 실명에 이르게 한다.
RPE65 유전자는 망막색소상피세포(Retinal Pigment Epithelium cell)에서 정상적인 시력에 필수적인 효소(화학반응촉진 단백질)를 만드는 데 관여한다. RPE65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RPE65 활성 수준이 감소하거나 없어지면 시력이 손상된다.
Theodor Leber(1840~1917)라는 독일 의사가 19세기에 레버 유전성 안과 신경병증(Leber’s hereditary optic neuropathy)을 처음 설명한 데서 병명이 유래했다. 지금의 LCA와는 다른 질환이다.
럭스터나는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를 벡터로 삼아 정상 인간 RPE65 유전자를 망막세포에 전달함으로써 시력을 회복시킨다. RPE65 유전자는 결과적으로 망막세포가 빛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케 해 시력상실 회복을 돕는다.
럭스터나를 투여 받으려면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안과(Division of Ophthalmology at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CHOP)에서 만든 진단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국에서는 여기에서만 치료받을 수 있다.
럭스터나는 망막세포 중 기능을 하는 세포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투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한계다. 럭스터나 치료로 인한 가장 흔한 부작용은 결막충혈, 백내장, 안압상승, 망막열공 등이다. 양안의 망막 아래에 단회 주사한다.
참고로 스파크테라퓨틱스는 2019년 2월 로슈에 48억달러에 인수됐고, 노바티스는 2018년 1월 럭스터나가 유럽연합 승인을 받자 유럽과 미국외(外) 판권을 스파크테라퓨틱스로부터 양수했다.
⑵노바티스의 ‘졸겐스마’(Zolgensma, Onasemnogene abeparvovec)
2019년 5월 24일에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유전자치료제로는 FDA 사상 두 번째다.
졸겐스마는 2세 미만 SMA 환자 중 SMN1(survival motor neuron 1) 유전자에 두 개의 대립유전자 변이(bi-allelic mutations)를 가진 경우에 정맥주사로 투여되도록 승인됐다.
SMA는 SMN1 유전자 변이로 인해 척수와 뇌간 운동신경세포가 손상돼 근육이 위축되는 신경근육계 유전질환이다. 뇌와 척수의 운동 뉴런은 몸 전체의 근육 움직임을 제어한다. 기능성 SMN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운동 뉴런이 죽어 쇠약해지고 종종 치명적인 근육 약화가 발생한다. 이 질환은 신생아 1만명 당 1~2명꼴로 발생한다. 인지기능은 정상이지만 근육 긴장성이 떨어지고, 혀 근육이 수축되는 등 정상생활이 어렵다.
발병 연령, 신체발달 지표 등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6개월 미만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SMA 1형(영아 발병형)은 가장 흔하고(약 60% 차지) 심각한 유형으로, 증상이 심각해 대부분(환자의 약 90%) 만 2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다. 과거에는 근육 형태 변형과 기능장애를 완화하는 물리치료 외에 마땅한 약물요법이 없었다.
SMA 1형을 대상으로 진행한 ‘START’ 3상 임상의 장기관찰 연구 결과, 투여 후 7년 이상 치료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용량을 투여한 10명 중 사망 또는 영구적 호흡기 사용의 발생은 없었고, 7명의 환자들은 START 임상에서 달성한 최소한의 운동기능을 유지했으며, 3명이 ‘보조받아 서기’의 운동 기능을 새롭게 달성했다.
평생 한번 투여로 체내에서 SMN 단백질이 지속 생성돼 전신에 분포되는 혁신적인 기전을 입증했다. 이 약은 2022년 8월 1일자로 국내서 19억8172만6933원에 급여가 허락됐다. 졸겐스마의 미국 내 출시 가격은 2019년 당시 210만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⑶블루버드바이오의 ‘진테글로’(Zynteglo, 베티베글로진 오토템셀, betibeglogene autotemcel, 일명 beti-cel)
미국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의 중증 유전성질환 및 암 치료용 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 생명공학기업 블루버드바이오(bluebird bio)가 개발한 진테글로는 2022년 8월 17일에 정기적인 적혈구 수혈이 필요한 소아 및 성인의 베타-지중해빈혈의 치료제로서, 이 질환의 세포 기반 유전자치료제로서는 FDA 사상 처음으로 허가받았다.
베타-지중해빈혈은 헤모글로빈의 베타-글로빈 하부 단위에 변이가 나타나면서 혈중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및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체내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유전성 희귀 혈액질환이다. 적혈구 수치가 감소하면 현훈, 쇠약, 피로, 골 건강이상 등 다양한 문제와 중증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다.
베타-지중해빈혈 가운데서도 수혈 의존성은 평생 적혈구 수혈이 필요할 만큼 더욱 중증이다. 하지만 2~5주마다 이뤄지는 정기적인 수혈은 체내의 과도한 철분 축적으로 인해 심장, 간, 기타 장기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연간 1300~1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이 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평균 나이는 37세였다.
진테글로는 체내에 단회 투여한다. 환자 자신의 골수줄기세포를 추출해 베타-글로빈 유전자(βA-T87Q-globin gene)를 심는 유전적 변형을 거쳐 기능성 베타-글로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조한 환자개인별 맞춤치료제다. 2019년 6월 유럽에서 승인받았으나, 2021년 4월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유럽시장에서 철수했다.
⑷블루버드바이오의 ‘스카이소나’(Skysona, elivaldogene autotemcel, 일명 eli-cel)
스카이소나는 2022년 9월 16일에 대뇌부신백질이영양증(cerebral adrenoleukodystrophy, CALD, 일명 로렌조오일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 초기 활동성 CALD를 앓는 4~17세 남성 환자에서 신경기능장애 진행을 늦추기 위한 단회 치료제다. 약가는 300만달러(도매가)로 정해져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이 됐다. 그 다음으로 비싼 약이 진테글로(280만달러)다.
이 질환은 ABCD1(또는 Adrenoleukodystrophy protein, ALDP) 유전자 변이로 인해 ALDP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고, 이로 인해 초장쇄지방산(very long-chain fatty acid, VLCFA)이 세포내에 축적되면서 뇌 안에 있는 신경섬유의 수초가 손상되고, 점차적으로 부신의 퇴행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ALDP는 각종 장기에서 퍼옥시좀 베타산화(peroxisomal beta-oxidation)와 VLCFA 분해를 담당한다. 정상적인 ALDP는 뇌내 VLCFA 분해를 촉진하고, 염증과 탈수초화 진행을 막기 때문에 제대로 유전자가 주입돼 발현될 경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카이소나는 환자 조혈모세포를 채취해 체외에서 ABCD1 유전자의 기능적 복사본을 렌티-D바이러스 벡터(LVV)에 실어 환자에 재주입하는 단회성 유전자치료제다. 스카이소나는 ABCD1 유전자 변이가 있고, 가족 등으로부터 조혈모세포 제공을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다.
대뇌 부신백질 이영양증은 희귀 진행성 신경퇴행성, X-염색체 반성 유전질환이다. 주로 남성 연소자에서 나타나며 행동·인지력·신경계에 결함을 유발한다. 의사소통 능력 상실, 피질성 실명, 튜브영양 필요, 완전 요실금, 휠체어 의존, 자발적인 움직임의 완전 상실 등 6가지 주요기능장애(Major Functional Disabilities, MFDs)를 포함한 비가역적, 파괴적인 신경학적 저하를 유발한다. 치료받지 못한 환자는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처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한다.
이 병은 1992년 영화 ‘로렌조오일’(Lorenzo’s Oil)에서 CALD를 앓는 소년과 그의 부모가 애타게 치료제를 찾는 일화가 소개돼 유명해졌다. 로렌조는 병든 소년의 이름이고 로렌조오일은 그 부모가 CALD 증상을 유발하는 VLCFA를 상쇄하기 위해 개발한 예방용 식품으로 올레산(oleic acid)과 에루신산(erucic acid)의 트리아실글리세롤(triacylglycerol) 형태를 4대1로 섞은 혼합물이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50명의 남아가 CALD에 걸리고, 블루버드바이오는 이 중 약 10명 정도를 치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⑸호주 CSL베링(CSL Behring)의 ‘헴제닉스’(Hemgenix, etranacogene dezaparvovec-drlb)
헴제닉스는 2022년 11월 22일, 성인 B형 혈우병 유전자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
헴제닉스는 현재 제9혈액응고인자 예방요법제를 사용 중이거나, 현재 또는 과거에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 증상이 나타났거나, 중증의 자연출혈발작이 거듭 나타나는 성인 B형 혈우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허가됐다.
헴제닉스는 제9혈액응고인자(FIX) 관련 고기능 복제본 유전자(FIX-Padua)를 변형된 무해한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5(AAV5) 운반체에 담아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단회용 유전자치료제다. 이 유전자는 간 내부에서 발현해 제9혈액응고인자 단백질을 생성시켜 혈중 제9혈액응고인자의 수치를 높임으로써, 출혈 발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FIX-Padua는 표준 F9 유전자보다 8배에 달하는 9인자 혈액응고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회 투여하므로 주기적으로 예방요법제를 투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
CAR-T, ASO, siRNA를 제외한 순수 유전자치료제로는 FDA 사상 5번째로 승인됐다. 럭스터나, 졸겐스마, 진테글로, 스카이소나에 이어 승인받았다.
⑹페링파마슈티컬스의 ‘애드스틸라드린’(Adstiladrin, nadofaragene firadenovec-vncg)
애드스틸라드린은 2022년 12월 16일, 유두종(乳頭腫, papillary tumor)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상피내암(carcinoma in citu, CIS)을 나타내는 바실러스 칼메트-게랭균(Bacillus Calmette-Guerin, BCG) 백신 불응성, 고위험성 성인 비근육 침습성 방광암(Non-Muscle Invasive Bladder Cancer, NMIBC)을 적응증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데노바이러스 운반체 기반 유전자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애드스틸라드린은 인터페론 알파-2b(interferon alfa-2b) 유전자를 함유한 비복제(non-replicating)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기반 유전자치료제로 3개월에 1번, 카테터를 통해 방광에 투여한다. 벡터는 방광벽의 세포로 들어가 활성 유전자를 방출해 작동한다. 이후 방광 세포는 유전자를 장착(pick up)해 DNA 서열을 번역, 다량의 인터페론 알파-2b 단백질을 분비토록 유도한다. 이 유전자치료제는 환자 자신의 방광벽 세포를 인터페론 미세공장(microfactory)으로 바꾸어 암에 대한 신체의 자연 방어력을 강화하게 된다.
NMIBC는 재발률이 30~80%로 높고, 침습성 암 또는 전이성 암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다. 고위험성 NMIBC 환자의 치료는 암을 절제하고 암면역 화학요법제의 일종인 BCG백신을 사용해 재발 위험성을 낮추는 게 기본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BCG로 초기 치료를 받는 환자의 50% 이상이 1년 이내에 질병의 재발 및 진행을 경험하고, 다수가 불응성이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승인된 게 애드스틸라드린이다.
⑺사렙타테라퓨틱스 ‘엘레비디스’(Elevidys, delandistrogene moxeparvovec-rokl)
엘레비디스는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기반 유전자치료제로, 뒤센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 DMD) 변이가 확인된(양성) 4~5세의 거동이 불편한(ambulatory) 소아 뒤센근이영양증 치료제로 2023년 6월 22일 FDA 승인을 받았다.
뒤센근이영양증은 X염색체의 p21 위치에 있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DNA에 코딩된 디스트로핀(dystrophin) 단백질 합성이 이뤄지지 않아 일어나는 호흡기능 저하, 심근병증으로 12세 이전부터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고 청년기에 조기 사망하는 질환이다. 주로 남아에서 나타나는 반성 열성(sex-linked recessive) 유전질환이다.
엘레비디스(SRP-9001)는 압축된 형태의 디스트로핀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근육세포에 전달함으로써 뒤센근이영양증의 근본적인 유전적 원인을 해결하도록 설계됐다. FDA는 엘레비디스로 치료받은 환자들에게서 마이크로-디스트로핀(micro-dystrophin) 유전자의 발현이 관찰되었음을 근거로 가속승인을 결정했다.
이로써 엘레비디스는 DMD 사상 첫 유전자치료제가 됐다. 기존 치료제로는 문제가 생긴 DMD 유전자 엑손(exon)을 연접 조절(splice-modulating) 또는 차폐(knockdown)해 발현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티센스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ntisense oligonucleotide, ASO)가 전부였다.
⑻바이오마린파마슈티컬(BioMarin Pharmaceutical)의 ‘록타비안’(Roctavian, Valoctocogene Roxaparvovec, 옛 상품명 Valrox)
록바티안은 아데노관련바이러스 혈청형 5(AAV5)에 대한 항체가 없는 중증 A형 혈우병 성인 환자를 위한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2023년 6월 29일 FDA승인을 받았다. 가장 최근에 허가된 통산 8번째 유전자치료제다.
록타비안은 중증 A형 혈우병(제8혈액응고인자 활성도 1 IU/dL 미만인 선천성 8인자 결핍증)을 앓는 성인 환자의 치료를 위해 1회 단일용량으로 투여하는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AAV) 벡터 기반의 유전자치료제다. 록타비안은 돌연변이 유전자의 기능을 교체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들이 8인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정함으로써 출혈 에피소드를 제한하도록 설계됐다.
임상 결과 6개월 동안의 기저 연간 출혈률(nnualized bleeding rate, ABR) 데이터가 전향적으로 수집된 환자 112명의 경우 기존 일상적 8인자 예방요법을 받던 환자의 경우 5.4건에서 록타비안 투여 후 추적기간(중앙값 3년) 종료 시점 기준 2.6건으로 평균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록타비안 투여 이후 자발성 출혈이 2.3건에서 0.5건으로, 관절 출혈이 3.1건에서 0.6건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록타비안 투여군은 대다수는 일상적 예방요법을 추가로 받지 않았고 최소 3년 이후에도 치료 반응이 지속됐다.
록타비안에 대한 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서(BLA)는 2019년말 처음 FDA에 제출됐고 2020년 8월 18일 임상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당하는 대응종결서신(CRL)을 수령했다. 임상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늘리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바이오마린은 2022년 10월 12일 모든 피험자의 2년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보완자료를 첨부해 BLA를 재제출했다. 이후 데이터 분석 및 생산현장 실사 지연 등으로 당초 2023년 3월말에 나올 승인이 3개월 또 미뤄졌다. 그만큼 FDA는 유전자치료제를 승인하면서도 아직은 유효성이나 안전성에 확고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⑼美 FDA, 최초의 유전자편집 치료제 ‘카스게비’ 승인 … 11월 영국에 이어 두 번째 … 2023년 12월 8일 FDA 승인 (이하 내용은 추후 추가된 내용입니다. 본지 헬스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