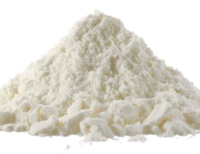칼륨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PCAB)는 H+/K+ adenosine triphosphatase(ATPase, 양성자펌프)는 프로톤펌프의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결합해 억제하느냐가 PPI 제제와 차별화된다.
기존 H2RA와 PPI는 위산분비 억제 효과가 좋아서 위산 관련 질환 치료제로 많이 사용돼왔다. 하지만 H2RA는 위산분비 경로 중 히스타민 경로만 차단하기 때문에 쉽게 내성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PPI는 전구약물(prodrug)로서, 산성 하에서 활성화 과정을 거친 후에 약효를 발휘하기 때문에 작용발현 시간이 느리고 반감기가 짧아서 ‘야간 산분비 돌파’ 억제 효과가 적어 한계를 드러냈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 대사경로를 공유하는 약물이 많아 약물상호작용으로 지장을 받았다. 식사 30분 전에 복용해야 하는 약물 투여시간의 제약도 단점으로 작용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의 위산 관련 질환 치료제가 PCAB다. PPI는 수소이온(위산, 산성 조건) 자극에 의하여 활성화된 양성자펌프에만 비가역적으로 결합하는 반면 PCAB은 기존 PPI와는 달리 산성 조건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 없다. 이 때문에 활성화된 양성자펌프뿐만 아니라 세포질의 소낭(tubulovesicle) 내 비활성형 양성자펌프와도 ‘가역적’으로 결합한다.
또 PPI는 위벽 분비소관(secretory canaliculi) 내부의 산성 환경에서 활성화체로 전환되어 H+/K+ ATPase에 비가역적으로 공유결합한다. 즉, 위 벽세포에 의해 흡수된 후 활성체인 sulfenamide로 바뀌어야 약효가 나온다.
반면 PCAB은 위벽 분비소관에 고농도로 축적돼 H+/K+ ATPase에 가역적으로 결합하게 되므로 활성화를 위한 산성 환경이 필요 없다. 이 때 PCAB은 H+/K+ ATPase의 K+(칼륨 양이온) 결합 도메인(binding domain)에 경쟁적으로 결합해 칼륨의 유입을 억제한다. 위 벽세포에서 H+/K+ ATPase에서 K+가 유입되고 H+가 배출돼야 위산이 생성되는데 K+ 도메인을 틀어막으니 H+/K+ 간 교환이 정지되면서 위산분비가 차단된다.
PPI가 비가적역적으로 프로톤펌프를 억제하므로 일견 PCAB보다 강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PPI는 프로드럭으로서 산성 조건 하에서 활성화돼 약효를 발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반해 PCAB은 산성이란 조건 없이 곧바로 신속하게 양성자펌프를 차단하니 약효가 빠르게 나타난다.
아울러 PPI는 프로톤펌프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지만 새로 생성되는 프로톤펌프(H+/K+ ATPase)에는 작용하지 못하며 점차적으로 위산분비 기능이 되살아나면서 야간에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약효가 떨어지게 된다. 반면 PCAB은 프로톤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프로톤펌프는 물론 새로 생성되는 프로톤펌프도 차단하고 위 분비소관에 축적돼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감기 및 약효지속시간이 길어진다. 덕분에 PPI에서 나타나는 야간 산분비 돌파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더 나은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PCAB 과 PPI 간 차이점
항목 | PCAB | PPI |
작용 방식 | 활성화 과정 없이 바로 작용 | 프로드럭, 활성화 후 작용 |
프로톤펌프와 결합 형태 | 가역적, 이온결합 | 비가역적, 공유결합 |
프로톤펌프 차단 범위 | 활성형 및 비활성형 모두 차단 | 활성형 펌프만 차단 |
위 분비소관 내 축적(위산에 대한 안정성) | 축적됨(안정함) | 축적 안 됨(불안정함) |
반감기 | 테고프라잔 4.1시간, 펙수프라잔 9.7시간, 보노프라잔 7.7시간, 자스타프라잔 6~10시간 | 1~2시간 |
약효에 대한 식사 영향 | 식사와 무관하게 균등한 약효 | 식사 30~60분전에 복용해야 약효 확보 |
복용후 산억제 최대기간 | 1일 | 3~5일 |
2005년 최초로 유한양행이 국산신약 9호이자 세계 최초의 PCAB인 레바프라잔(revaprazan 유한양행 레바넥스정)을 국내서 승인받았다.
발매 당시에는 PCAB이 아닌 위산펌프길항제(acid pump antagonist, APA)로 기전을 설명했다. 레바프라잔은 당시에 위산분비를 억제하고, 위점막 및 위벽을 보호하는 2가지 효과를 갖고 있다고 소개됐다.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는 수소양이온을 위 안으로 품어내는 프로톤펌프를 비가역적으로 저해하는 반면 레바넥스는 펌프를 가역적으로 저해함으로써 위산분비가 지나치게 억제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효를 설명했다. 또 당시에는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는 수일이 지나야 약효가 나타나고 위산의 낮은 pH 상태에서는 약물로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혈중 가스트린 농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며, 위점막을 비후화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레바넥스는 이런 단점을 크게 줄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됐다.
레바프라잔은 가장 먼저 십이지장궤양의 단기 치료제로만 허가됐고, 이후에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의 개선, 위궤양의 단기치료라는 적응증을 추가했으나 시장이 큰 기능성 소화불량, 위산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박멸 등에서 적응증을 획득하지 실패함으로써 ‘미완의 작품’이 됐다. 이후 후발 신약이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자진 퇴출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아직은 시장에 남아 있다.
레바프라잔 등장 이후 보다 기능이 개선된 PCAB제가 나왔다. 일본 다케다제약이 개발한 보노프라잔(vonoprazan, ‘보신티정’)이 일본에서 2014년 12월 허가받았다. CJ헬스케어(현 HK이노엔에 인수됨)이 개발한 테고프라잔(tegoprazan, ‘케이캡정’)은 2018년 7월 5일에, 대웅제약의 펙수프라잔(fexuprazan, ‘펙수클루정’)은 2021년 12월 30일, 제일약품 계열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스타프라잔’(zastaprazan, ‘자큐보정’)은 2024년 4월 24일에 국내 허가를 받았다. 각각 국산 30호, 34호, 37호 신약이다.
보노프라잔은 다케다가 2019년 5월에 미국 개발권을 넘긴 Phathom Pharmaceuticals에 의해 추가 개발돼 2023년 11월 1일에야 미국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성인의 미란성 GERD 치료 및 이와 관련된 핫번 증상의 경감을 목적으로 허가받았다(10mg 및 20mg). 2024년 7월 18일에는 미국에서 성인의 비미란성 GERD 관련 핫번 증상 경감 적응증을 추가했다(10mg). 하지만 국내서는 국산신약의 등장에 따른 경쟁 격화로 2024년 12월 12일 허가를 취하하고 철수했다. 경쟁약 대비 GERD의 재발 비율이 낮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상대적으로 약물상호작용이 많은 편에 속한다.
테고프라잔은 sulfinyl benzimidazole 유도체인 기존 PPI와 유사한 benzimidazole carboxamide 구조를 가진다. 반면 보노프라잔은 sulfonyl pyrrole 구조다. 따라서 두 약물은 기전상 같은 계열로 분류되지만 화학구조가 달라 상호 약물군효과(class effect)를 공유하지 않는다. 펙수프라잔은 보노프라잔과 같은 sulfonyl pyrrole 구조다. 반면 자스타프라잔은 테고프라잔과 같은 benzimidazole carboxamide 구조다.
테고프라잔은 현재 가장 많은 5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다.
펙수프라잔은 2021년 12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제로 첫 승인을 받았고, 2022년 7월에 건강보험 급여가 개시됐다. 2022년 8월에는 PCAB제제로는 국내 유일하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10mg에 한함) 적응증을 추가했다.
대웅제약은 추가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인한 궤양 예방 적응증 추가를 위해 3상을 진행 중이다. 헬리코박터(helicobactor pylori) 제균 치료 임상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 복용편의성을 위해 구강붕해정, IV제형(주사제) 등 제형 확장을 준비 중이다. 경쟁약인 케이캡정은 이미 혀 위에 놓고 침으로 녹여먹는 구강붕해정이 나와 있어 환자의 복약편의성을 개선했다.
가장 나중에 나온 자스타프라잔은 3상에서 8주간 투여 시 치료율 97.9%를 나타냈다. 4주간 투여 시 비교군(에스오메프라졸)보다 7.4%p 높은 치료율을 보여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현재 케이캡정은 HK이노엔과 보령이, 펙수클루정은 대웅제약과 종근당이, 자큐보정은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공동 마케팅 대결에 나서고 있다. 국산신약 3개 품목이 경합하는 국내 시장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현재 PCAB은 미국 및 그 외 국가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 ERD, NERD, 소화성궤양, 위염 등의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향후에는 훨씬 난치성인 호산구식도염(Eosinophilic esophagitis), 바렛식도, 비정맥류성 위장관출혈(Nonvariceal gastrointestinal bleeding), 비궤양성(기능성) 소화불량 등으로 적응증을 개척해나갈 전망이다. 또 임신 및 수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PCAB 계열 국산 3대 신약의 비교
항목 | 테고프라잔 | 펙수프라잔 | 자스타프라잔 |
적응증 |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위궤양의 치료, 소화성 궤양 그리고/또는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에 한함)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10mg에 한함)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
GERD 치료 용량 | 1일 1회, 50 mg을 4주간 경구 투여 | 1일 1회, 40mg을 4주간 경구 투여 | 1일 1회, 20 mg을 4주간 경구투여, 치료되지 않는 경우 4주 추가 투여 |
반감기 | 4.1시간 | 9.7시간 | 8시간(6~10시간) |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 0.5~1시간 | 1.75~3.5시간 | 0.5~1시간 |
pH4 도달시간 | 1시간(약효 신속) | - | - |
배설 | -담즙: 41.1% -뇨: 25.7% -변: 28.4 | -담즙: 88% -뇨: 18.8% | -담즙: 73.6% -뇨: 14.9% -변: 10.7% |
부작용(1% 이상 발현) | 소화불량, 설사, 오심, 호흡기감염 | 소화불량, 설사, 오심, | 열공탈장, 코로나19 감염, 대상포진 감염 |
장점 | 1. 빠른 효과발현 시간 2. 6개월 이상 간독성 관찰되지 않음 3. vonoprazan 대비 약물상호작용 적음 | 1. 긴 작용지속 시간 2. 아직 유의미한 간독성 관찰되지 않음 3. vonoprazan 대비 약물상호작용 적음 | 1. 빠른 효과 발현 2. 최대 10시간의 반감기로 약효 지속성 우수 3. 위장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
기타
이같은 주된 GERD 치료제와 함께 위와 식도에서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식도하부괄약근의 압력을 높여주는 위장관운동촉진제(pro-kinetics)를 종종 함께 쓴다. 모사프라이드(mosapride), 돔페리돈(domperidone) 등이다. 드물지만 식도 염증이 심할 경우 항생제를 복용해 증상을 눌러주기도 한다. 현재의 약물요법으로 위산식도역류 환자의 90% 이상이 증상 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