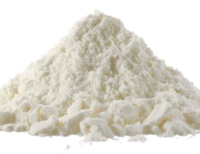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론병 병태생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생물학적제제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점막 치유 효과가 높아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종양괴사인자억제제 … 인플릭시맙·아달리무맙
종양괴사인자억제제(anti-tumor necrosis factor-α agent, anti TNF-α)는 종양괴사인자(TNF)가 TNF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TNF억제제가 TNF와 결합하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신호전달 과정이 차단됨으로써 염증 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TNF-알파는 염증성 자가면역질환 발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로 정상적인 면역반응을 조절하며 염증을 촉진한다. TNF-알파가 과잉 생산되면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 등 염증성장질환뿐만 아니라 강직성척추염, 류마티스관절염, 건선과 같은 만성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TNF-알파는 과도한 염증과 세포 손상을 야기한다.
TNF억제제 중 인플릭시맙(infliximab), 아달리무맙(adalimumab) 등이 크론병 치료제, 궤양성대장염 치료제로 허가돼 있다. 골리무맙(golimumab, 상품명 Simponi. 한국얀센의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은 궤양성대장염에만 허가가 돼 있다.
인플릭시맙과 아달리무맙의 약효를 정면 비교한 연구는 없어 현재는 한쪽 약으로 치료해 듣지 않을 경우 다른 약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미라의 적용 연령대의 폭이 다소 넓고, 세부 적응증도 약간 넓기 때문에 우위를 가진다.
더욱이 인플릭시맙은 유도요법 후 8주마다 맞는 정맥주사제(2시간 동안 주입)이고, 아달리무맙은 2주마다 투여하는 피하주사제라 주사 편의성에서도 아달리무맙이 우위다. 다만 셀트리온이 투여가 간편한 인플릭시맙 성분의 피하주사(상품명 ‘램시마펜주’(램시마SC))를 내놓고 전세계적으로 마케팅 중이다. 골리무맙은 당초 30분 동안 정맥주사하는 제제로 출시됐다가 지금은 유도요법 후 4주에 한번 주사하는 피하주사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맥주사제는 보통 병원 입원실이나 주사실에서 1~2시간에 걸쳐 투여된다.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약물관리를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장점이다. 반면 피하주사제는 복부, 허벅지 등의 피하조직에 투여한다. 가벼운 통증이나 발적이 생길 수 있지만 투여시간이 10초 내외로 짧고 편하게 투여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인플릭시맙은 염증을 유발하는 종양괴사인자(TNF-α)가 장에서 과다 생성되는 것을 차단하며 불응성 크론병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됐다.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여주고 점막 치유뿐 아니라 수술률 및 수술 후 재발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건선 등에 쓰여왔으며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인플릭시맙은 얀센 ‘레미케이드주사’(인플릭시맙)가 오리지널이며, 바이오시밀러(복제 생물학적제제)로는 ‘Avsola’(infliximab-axxq 암젠), ‘Ixifi’ (infliximab-qbtx 화이자), ‘Renflexis’(infliximab-abda 삼성바이오에피스), ‘
Inflectra‘(infliximab-dyyb, 셀트리온, 이상 미국 상품명) 등이 있다.
다른 TNF-α억제제인 아달리무맙은 활동성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베체트장염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점막치유 효과 및 입원율과 수술률 감소 효과를 보여줘 이들 염증성장질환의 치료 목표인 ‘질병의 자연경과 변화’에 적합한 약제로 입증됐다.
애브비 ‘휴미라주’(아달리무맙)가 오리지널이고 바이오시밀러로는 10개 제품이 나와 있다(표 참고). 바이오시밀러의 대거 등장은 치료제의 세대교체에 버금가는 영향을 끼친다고 할 것이다.
휴미라는 2002년 출시 후 거의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전세계 의약품 매출 1위를 달려왔으나 2022년 212억3700만달러로 정점을 찍고 2023년 1월 31일부터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서 점차 매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아달리무맙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로는 현재 10개 제품이 미국에서 허가돼 있다. 후발 제품의 경쟁력은 낮은 공급가가 되겠지만 미국의 왜곡된 제약시장에서는 낮은 공급가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약하고 떨어진 약가로 인한 차익을 의료보험사, 처방약 급여관리회사(Pharmacy Benefit Manager, PBM 처방약 이윤을 분배하는 회사),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이 정해진 룰에 의해 나눠갖는 구조라서 ‘저가약’이 막대한 경쟁력을 갖지는 못한다.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에 비해 15~30%(최대 50%) 저렴하다. 하지만 이 중 소비자(본인부담금 기준)에게 돌아가는 약가 인하 혜택은 5%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아말리무맙 바이오시밀러는 고용량으로서, 투여량을 줄여 환자의 복약순응도(유지요법 실천율)를 높이고 이로 인해 약효(관해달성률 및 관해유지기간)를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첨가제로 쓰이는 구연산을 제거함으로써 주사 시 통증을 낮추는 데도 경쟁 포인트를 두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는 ‘대체조제가 가능한’(호환 가능, Interchangeable) 인증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의약품 승인 당시 획득하는 게 경쟁에 유리하다. 미국에서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되면 의사의 동의 없이도, 환자가 승낙할 경우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가능해진다. 인터체인저블로 지정받은 바이오시밀러가 일반 바이오시밀러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차이가 있거나 우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사나 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대체 처방 또는 조제할 때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미국 FDA는 성분별로 2개씩만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를 승인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시장이 워낙 크고 개발 경쟁이 심해 현재 10개 중 3개가 인터체인저블로 허가돼 있다. FDA는 바이오시밀러가 난립하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거나, 의약품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터체인저블 허가를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체인저블 승인 약과 비 승인약에 약효 차이가 없는데 이런 개념을 유지하다는 게 비합리적이어서 폐지 여론이 강한 게 현실이다. 즉 모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허용하자는 의견이 팽배하다. 현재 FDA는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지만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애브비는 ‘휴미라 오리지널’의 명성에 힘입어 예상 밖으로 바이오시밀러 집중 출시에 의한 매출이 급감하지 않고 점진적인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휴미라는 다른 외국보다 약가를 낮게 책정하는 저가 전략을 폄으로써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이 늦어졌다.
TNF억제제로는 이밖에 ‘엔브렐’(etanercept), ‘오렌시아’(abatacept), ‘퍼스티맙’(certolizumab-pegol, 다른 상품명 Cimzia) 등이 있지만 모두 류마티스관절염에 초점을 맞춘 약들이다. 퍼스티맙의 경우 국내서 선발약들과의 경쟁에 밀려 2017년 5월 국내서 자진 철수했다. 퍼스티맙은 미국에서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중등도~중증 크론병 치료제로 허가돼 있다.
인테그린 억제제(백혈구 세포부착 억제제) … 베돌리주맙
염증성장질환에서 활발히 쓰이는 생물학적제제 중 하나는 백혈구 부착에 관여하는 인테그린(integrin)을 억제하는 계열 약물이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베돌리주맙(vedolizumab, 한국다케다제약의 ‘킨텔레스주’, 미국 제품명 ENTYVIO)다. 킨텔레스는 혈액 속 B림프구 및 T림프구의 세포 표면 당단백질인 integrins α4β7과 결합해 내피세포와 백혈구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MAdCAM-1를 차단함으로써 기억 T-림프구(memory T-lymphocyte)가 내피세포를 거쳐 염증이 있는 위장관 실질조직(inflamed gastrointestinal parenchymal tissue)으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해 염증의 확산을 방지한다.
킨텔레스는 2014년 5월 20일, 미국에서 보편적 치료(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의 치료) 또는 종양괴사인자 알파(Tumor Necrosis Factor-α) 억제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반응이 없어지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중증의 활성 궤양성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같은 적응증으로 2015년 6월 9일 국내 허가를 받았다. 킨텔레스 정맥주사는 2020년 8월 1일부터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을 받았고, 피하주사 제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급여를 인정받았다.
염증성장질환에서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항인테그린 제제다. 같은 계열의 나탈리주맙(natalizumab, 바이오젠·에자이 ‘티사브리주’)은 α4-integrin에 대한 IgG4 인간화 재조합 단일클론항체로 현재 다발성경화증에만 적응증을 갖고 있다.
TNF-α억제제를 투여한 궤양성대장염·크론병 환자 중 약 33%는 반응하지 않으며, 효과를 보인 나머지 67% 환자 중 3분의 1은 상당 기간 경과 후 반응이 소실된다. TNF-α억제제는 염증세포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염증세포들은 외부 세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감염에 대한 방어체계가 약해지면서 결핵 등 감염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따른다. TNF-α억제제를 오래 쓰면 처음에 반응을 보이던 환자도 내성 때문에 치료효과가 떨어져 결국 수술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인테그린 억제제 등 TNF-α억제제와 다른 항염증반응 기전을 가진 다양한 제제들이 필요하다.
인터루킨 억제제 … 우스테키누맙, 리산키주맙
인터루킨 억제제로는 우스테키누맙(ustekinumab, 한국얀센 ‘스텔라라프리필드주’)와 리산키주맙(risankizumab, 한국애브비 ‘스카이리치프리필드주’)가 있다.
우스테키누맙은 당초 건선(2009년, 이하 미국 기준)과 건선성관절염(2013년) 치료에만 처방됐으나 2016년 9월 중등도~중증 크론병, 2019년 10월 중등도~중증 궤양성대장염 적응증을 획득하면서 TNF-α억제제로도 치료되지 않는 크론병 환자에 쓸 수 있게 됐다.
스텔라라는 국내에 상륙한 최초의 인터루킨 억제제다. 염증세포를 활성화해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인터루킨12(IL-12)와 인터루킨23(IL-23)의 작용을 동시에 차단한다. 이 약은 크론병의 경우 환자 체중에 따라 유도요법으로 260㎎, 390㎎, 520㎎ 용량을 1회 정맥투여한 후 치료 8주째에 90㎎을 피하주사한다. 이후 유지요법으로 12주에 한 번 90㎎을 피하주사한다.
리산키주맙도 먼저 건선(2019년, 이하 미국 기준)과 건선성관절염(2022년)으로 허가받은 뒤 2022년 6월 세번째로 중등도~중증 성인 활동성 크론병 적응증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2014년 6월에는 궤양성대장염 적응증을 추가 획득했다.
인터루킨-23 저해제 가운데 성인 크론병 치료제로 승인된 것은 스카이리치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크론병과 궤양성대장염 모두 승인받은 것도 인터루킨-23 억제제로는 처음이다.
스카이리치는 크론병에서 0주, 4주, 8주째에 600mg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12주차에 360mg을 피하주사하며 이후에는 180mg을 8주마다 유지요법으로 피하주사한다.
스카이리치는 스텔라라와의 크론병 관련 비교임상에서 약효의 우월성을 입증했다. 24주차 임상관해 도달률이 스카이리치 투여군 58.6%, 스텔라라 투여군이 39.5%를 보였다. 궤양성대장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텔라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L-12 및 IL-23의 공통된 서브유닛인 p40에 결합해 IL-12에 대한 2차적인 억제 효과가 줄어들어 항염증 효과를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반면 스카이리치는 IL-23의 p19 서브유닛과의 선택적으로 결합해 염증 촉진 활동을 억제하므로 항염증 효과가 더 강할 것이란 설명이다. 인터루킨 23은 만성 염증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Th17 림프구를 자극해 건선이나 자가면역반응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스텔라라는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휴미라(아달리무맙)과의 비교 임상에서 52추 임상적 관해 유지율이 65%로, 휴미라의 61%에 소폭 앞서 비열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 FDA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는 암젠 ‘Wezlana’, 알보텍 ‘Uzpruvo’, 삼성바이오에피스 ‘Pyzchiva’, 동아에스티 및 일본 메이지세이카파마의 등이 ‘Imuldosa’ 있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인 ‘STEQEYMA’는 현재 미국에서 승인 심사 중이다. 웨즐라나와 이뮬도사는 대체조제 가능한 (interchangeable) 바이오시밀러다.